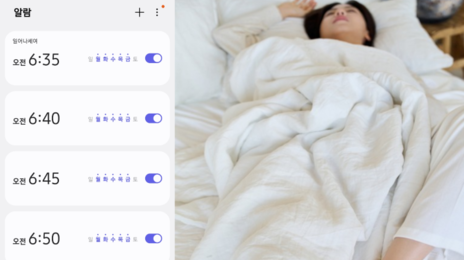공유하기
[건강/AIDS 감염부부의 눈물]“병보다 차가운 시선에 더 절망”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4시 47분
글자크기 설정

| ▼관련기사▼ |
에이즈의 암운(暗雲)은 딸에게 먼저 드리웠다. 97년 12월 태어난 정은이는 8개월 뒤 젖을 떼자마자 병치레에 시달렸다. 6개월 이상 감기와 폐렴 증세가 끊이지 않아 시골에서 서울의 S병원으로 옮겼다. 입원 뒤에도 정은이는 한 달 이상 일그러진 얼굴로 숨을 몰아쉬었다. 입안은 헐고 온몸의 살갗이 벗겨져 짓물러진 상태로 악화됐다.
신씨와 남편 김모씨(31)는 정은이가 에이즈에 감염됐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망연자실했다. 곧이어 부부 모두 ‘에이즈 양성’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눈물만 흘리면서 배를 내려다봤다. 정은이의 동생이 6개월째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99년 4월, 신씨 가족에게는 지독히도 잔인한 4월이었다. 남편은 결혼 전 한두번 ‘외박’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사내인 둘째는 다행히 정상으로 태어났다. 임신 중이라도 약을 제대로 먹으면 ‘수직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말을 믿고 따른 덕분이다. 신씨는 둘째 아이의 주치의로부터 ‘음성’임을 최종 확인 받았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시댁의 한 식구는 침으로는 에이즈가 전염되지 않는데도 수저와 그릇 등을 씻을 때 세제를 적게 쓴다고 몰아붙였다. 장남인 남편을 중심으로 그렇게 화목하던 가족은 하나 둘 발길을 끊었다. 평소 친하던 이웃도 골목 어귀에서 눈을 마주치면 발길을 돌렸다.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아는 눈치였지만 모른 척 하면서 전화를 걸어주는 친정 여동생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가족은 신혼 보금자리인 충청도를 떠나 전국을 배회하다 서울로 ‘도피’해야만 했다. 2년 전 35평 아파트에서 ‘주인’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연립주택에 ‘월 세입자’로 살고 있다.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빚이 1억원을 넘겼다.
에이즈에 감염된 신생아는 1, 2년을 넘기기 어렵지만 정은이는 치료를 충실히 받은 덕분에 지금 건강한 모습이다. 가끔 외출도 하고 어른스러운 말로 엄마를 감동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정은이는 오랜 병치레 때문에 동생보다 키가 작다. 곧 학교에 갈 나이지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신씨 가족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몸 속의 바이러스보다 사랑과 이해가 결핍된 주위가 더 무섭다. 신씨 가족은 정말 죄를 지은 것일까?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
트렌드뉴스
-
1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2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3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합당은 2,3인자들이 대권욕망 표출한것”
-
6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
7
리프트에 배낭 버클 끼여 공중 매달려…日스키장서 외국인女 사망
-
8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9
이준석 “정부 관계자들, 5월 9일 전까지 집 팔 건가”
-
10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트렌드뉴스
-
1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2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3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합당은 2,3인자들이 대권욕망 표출한것”
-
6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
7
리프트에 배낭 버클 끼여 공중 매달려…日스키장서 외국인女 사망
-
8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9
이준석 “정부 관계자들, 5월 9일 전까지 집 팔 건가”
-
10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