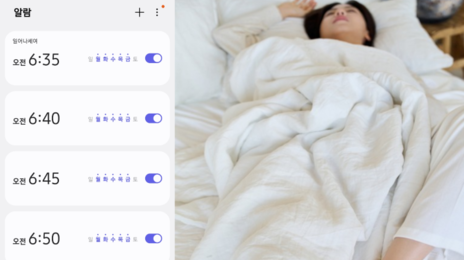공유하기
[기자의 눈]한기흥/미국인 가슴속의 9·11
-
입력 2002년 8월 26일 18시 13분
글자크기 설정

‘가난한 가정의 16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나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억척스러운 노력 끝에 기업의 간부가 됐던 30대 여자’ ‘영어를 거의 못하던 불법 이민자 출신으로 월스트리트 브로커로 성공했던 남자’ ‘손자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 주는 것이 행복이었던 자상한 할머니’ ‘눈비를 가리지 않는 골프광으로 몸이 아파도 친구와 돈내기 골프를 했던 남자’ 등등.
뉴욕타임스는 9·11테러 발생 1년이 다 돼 가도록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1개 면 전체를 할애해 희생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슬픔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이 장기 연재물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비명에 간 이웃과 동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9·11 참사의 교훈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자는 것이다.
미국에서 9·11테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길거리에선 성조기를 단 차량을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1년 내내 성조기를 집 밖에 내걸고 지낸 가정도 적지 않다.
다음달 초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각급 학교에서도 9·11테러는 중요한 교과목으로 자리잡았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등은 신입생들에게 9·11테러와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 코란을 반드시 읽도록 했다.
이 같은 미국의 모습은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비극적 사건 사고들이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한국과 크게 대조적이다.
한국인의 망각 속도가 미국인보다 빠른 것일까. 아니면 아픈 상처를 빨리 잊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인들은 슬픔을 통해 뭔가 교훈을 얻으려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쉽게 잊지 않고,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비극적 사건도 한두 달이 지나면 대개는 관심권 밖으로 사라져 버리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한기흥 워싱턴 특파원 eligius@donga.com
빛나는 조연 >
-

알쓸톡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빛나는 조연]英배우 주드 로/주연 압도하는 '2色 카리스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