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윤양섭]G7, G20, 그리고 G2
-
입력 2009년 4월 1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지난주에는 중국 런민(人民)은행 총재의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그는 “달러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역할을 확대하자”고 했다. 이 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까지 가세했다. 예전 같으면 중국 국가주석이 한마디 했다 해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또 지난달 초엔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의 경제가 걱정된다”고 훈수까지 했다. 미국에 1조 달러나 투자했는데 걱정되니 잘 좀 하라는 뜻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취임 뒤 첫 방문지로 아시아를 택했다. 중국 방문이 핵심이었지만 그는 중국의 인권 문제나 티베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영국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변에서도 중국이 자주 거론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주요국 정상과 만나면서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은 잡지 않았다. 지난해 사르코지 대통령이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한 보복이다. 보복은 끈질겼다. 올 초 원자바오 총리가 유럽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끌고 갈 때도 프랑스는 뺐다. 결국 프랑스는 이달에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총리, 현직 하원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중국으로 보낸다. 화해사절이다. 또 이번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핵심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을 뜻하는 G2의 모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해 7월 미국의 경제학자 프레드 버그스텐이 처음으로 꺼내 든 용어로,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G2 없이는 G20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해 힘을 보탰다.
이런 중국의 힘은 물론 경제력에서 나온다. 세계 3위의 국내총생산(GDP)에 높은 성장률, 2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 엄청난 내수시장이 그 바탕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짐 오닐은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BRICs)의 GDP가 2027년이면 선진 7개국(G7)의 합계를 넘어선다고 예측했다. 또 2030년대엔 세계 GDP 순위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순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경제 외적으로도 이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stakeholder)’라는 묘한 용어를 만들어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려 했다. 미국 혼자서 상대하기는 힘에 부친다는 뜻일 것이다.
요즘 중국 지도자들의 거침없는 말을 보면 이제 ‘미국 앞에서는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힘을 감추고 참고 기다린다)하라’라는 덩샤오핑의 유지를 벗어버릴 때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성당(盛唐)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강대국이다. 우리로서도 경제적으로 최대 교역국이며, 정치적으로도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중요한 나라다. 그런데도 못사는 중국, 민주화 덜 된 중국, 우리의 시선은 과거로만 향해 중국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에 우위를 점한 것은 불과 40년 정도다. 작금의 상황은 중국을 상대하는 우리의 국가 전략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윤양섭 국제부장 lailai@donga.com
차승재 >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영감 한 스푼
구독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5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6
열번 찍어 되찾은 태극마크… “첫 올림픽, 뭔가 남겨야죠”
-
7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8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9
[횡설수설/이진영]82세에 6번째 징역형 선고받은 장영자
-
10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10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5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6
열번 찍어 되찾은 태극마크… “첫 올림픽, 뭔가 남겨야죠”
-
7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8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9
[횡설수설/이진영]82세에 6번째 징역형 선고받은 장영자
-
10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10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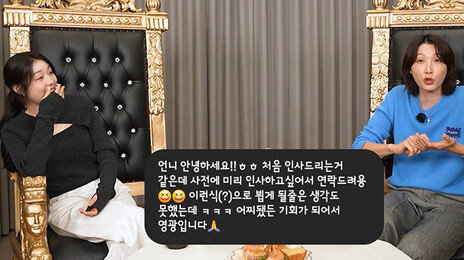
![82세에 6번째 징역형 선고받은 장영자[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21347.2.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