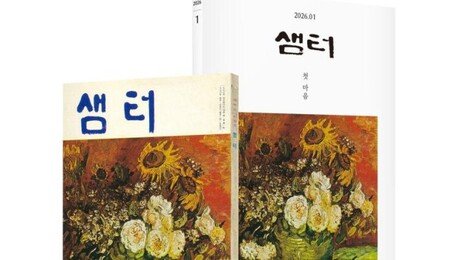공유하기
[홍찬식 칼럼]그 많던 지식인들 다 어디로 갔나
-
입력 2009년 1월 15일 19시 51분
글자크기 설정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에서 양쪽의 시각은 ‘대한민국 긍정’과 ‘대한민국 부정’으로 엇갈린다. 그 차이만큼이나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방송법 논쟁에서도 ‘미디어산업 육성’과 ‘언론 장악’이라는 동떨어진 화두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서로가 아무리 열심히 만나본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편 가르기’에 눈먼 知性아닌 지성
비교적 명백해 보이는 일에도 편이 갈라져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골프 외유에 대해선 대개 비판적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골프 안 치냐’라며 물타기를 한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KBS에 대해 ‘야당 의원에 대해서만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며 역공까지 편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처럼 생각이 전혀 다르거나 아예 편이 갈려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불가피하게 다수결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만든 체제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다수결로 이뤄진 결정이 옳았는지는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판단해 투표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결 방식은 정치의 대중영합을 부추겨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으므로 그 사회의 지성이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지식인 계층이 두꺼워야 완충작용으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한국 사회의 지식인 계층은 외형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식인’의 경계를 나누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20, 30대는 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많아 굳이 지식인 여부를 가리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의문이다.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천박함과 가벼움은 거꾸로 지성의 위기를 걱정하게 만든다.
전국 학력평가를 거부해 해임 조치된 어느 교사는 해임에 항의하는 시위장소에 어린 제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혹시 시위장에 오겠다고 해도 ‘너희가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렸어야 했다. 이 교사뿐 아니라 시위를 할 때 툭하면 철모르는 학생들을 거리로 끌고 나오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공익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의 앵커는 뉴스에서 ‘노조와 함께 파업을 해야 하니 내일부터는 방송에 못 나온다’고 거리낌 없이 발언한다. 이처럼 공사(公私) 구분이 실종된 판에선 시민단체가 비리에 연루되는 것 정도는 그리 놀라울 것도 없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남에게 독설을 퍼부어야 쾌감을 느끼는 듯하다. 그들의 오만한 말에 군중은 환호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미네르바’가 뜨는 동안 많은 지식인은 태도를 바꿔 무한한 복종심과 찬사를 보냈다. 그러다가 미네르바의 정체가 드러나고 오류가 확인되자 이번에는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羞恥알고 객관성으로 대립 풀어야
‘지식인’의 저자 스티브 풀러는 ‘지식인이라면 판단 능력과 다양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며 ‘일단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정중하게 인정하라’고 조언한다. 조선시대 선비의 덕목은 스스로 인격을 다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과 함께 예의와 염치를 아는 일이었다. 진실과 객관적 사고의 중요성, 자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조한 것이다. 요즘 지식인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나 이념에 눈이 가려 판단력과 수치심을 잃고 있다. 지식인의 실종은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그 많던 지식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홍찬식 논설위원chansi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기상도/흐림]연예인들 부정입학 파문 확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0/12/27/68037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