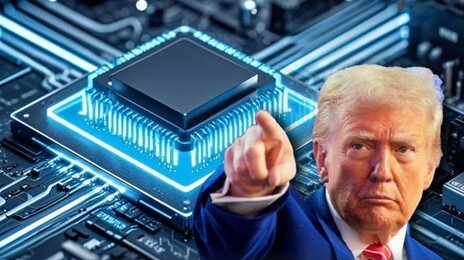공유하기
[윤득헌의 스포츠세상]한국마라톤 ‘화두’를 바꾸자
-
입력 2000년 12월 11일 18시 39분
글자크기 설정
35㎞ 지점에서 5위로 처졌던 이봉주가 앞선 선수들을 차례로 제치고 2위로 들어오다니. 마라톤에서 35㎞ 지점이 어떤 곳인가. 승부의 분수령이 되고 심장이 터질 듯이 고통스럽다는 지점이 아닌가. 이곳에서 밀리면 승부욕이 떨어져 앞선 선수를 따라잡거나 좋은 기록을 내기 어렵다는 통념을 그가 보란 듯 무너뜨렸으니 어찌 찬사가 아까울 것인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이봉주이다. 체력과 끈기, 경기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든다. 바로 이봉주를 따라 잡는 게 이번 대회 내 목표다.” 후쿠오카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의 신예 후지타 아쓰시 선수도 얘기했지만 나도 이봉주의 마라톤을 좋아한다. 물론 이봉주 같은 대선수가 마라톤 천재성이야 없을 리 없겠지만 어쩐지 천재성보다는 성실성이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것 같아서이다.
그렇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 개운치 않은 게 남는다. 무슨 일이든 뒤집어 보고야 마는, 그래서 ‘삐딱하다’란 소리도 듣게 되는 직업의 속성 탓인지는 모르겠다. ‘뭐야, 기록은 별거 아니잖아. 벌써 20번 이상 마라톤 완주를 한 이봉주가 우승한 것도, 자신의 최고기록을 깬 것도 아닌데…’라는 것이다.
이봉주가 올림픽에서 뜻하지 않게 넘어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꼭 그렇게 건재를 알려야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을까. 시드니 올림픽 우승자 아베라도 대회에 출전했지만 역시 2개월만의 출전은 무리가 아닌가. 이봉주는 아베라를 제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지만 아베라는 얻은 게 무엇인가. 단숨에 세계적 선수로 떠오른 후지타는 어떻게 2시간 6분대의 기록을 냈을까.
꼬리를 무는 생각은 끝내 하나로 모아진다. ‘우리도 세계기록을 의식할 때’라는 것이다. 황영조의 금메달, 이봉주의 은메달로 올림픽 마라톤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이다. 2시간 5분대의 세계기록, 2시간 6분대의 일본기록, 2시간 7분대의 한국기록. 아무래도 뭔가 허전하다.
마침 황영조도 체육진흥공단팀의 감독으로 데뷔하고, 삼성전자팀은 마라톤 용병을 꾀한다고 한다. ‘또 그 얘기’란 소리를 듣더라도 마라톤계에 과학적 선수육성과 관리를 주문해야겠다. 마라톤에서의 ‘큰 일’도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믿기에.
윤득헌<논설위원·체육학박사>dhyoon@donga.com
도쿄산책 >
-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구독
-

동아닷컴 신간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6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7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0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트렌드뉴스
-
1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2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3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이원종, 유인촌, 이창동…파격? 보은? 정권마다 ‘스타 인사’ 논란
-
6
‘뇌 나이’ 젊게 하는 간단한 방법 있다…바로 ‘□□’
-
7
70대 운전자 스쿨존서 ‘과속 돌진’…10대 여아 중상
-
8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9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10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1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2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7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8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9
‘전가의 보도’ 된 트럼프 관세, 반도체 이어 이번엔 그린란드
-
10
[오늘과 내일/우경임]아빠 김병기, 엄마 이혜훈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도쿄산책]심규선/‘유승준 소동’이해 못하겠어요](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