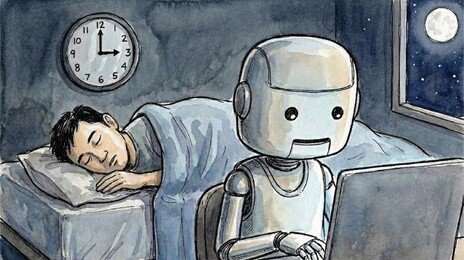공유하기
공포의 퍽…제 몸만 막은 초보 골리(아이스하키GK)
-
입력 2008년 7월 2일 08시 49분
글자크기 설정

링크에 마련된 라커룸에서 장비를 착용하면서 훈련 시간을 기다렸다. 하이원 김윤성 코치가 장비 착용을 도와줬다.
가장 먼저 아이스하키 전용 속옷으로 갈아입고 만약을 대비해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장구를 착용했다. 이어 아이스하키 전용 바지를 입었다. 여기까진 괜찮았다. 다음부터는 김 코치의 도움이 절실했다. 스타킹을 신는 것부터 스타킹 안에 정강이 보호대를 넣는 것까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어깨와 가슴을 보호해주는 장구를 착용한 뒤 유니폼을 입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김 코치가 없었다면 아마 유니폼조차 입지 못했을 것이다.
이어 스케이트를 단단하게 조인 뒤 장갑, 스틱, 헬멧을 받았다. 모든 장비를 착용하니 하나둘씩 문제가 생겼다. 답답해서 헬멧을 벗으려면 장갑과 스틱을 다 내려놓아야 했다. 한쪽 장갑만 벗고 헬멧을 벗으려고 시도해봤지만 불가능했다. 각종 장비 착용으로 몸이 둔해져 장갑은 떨어지고 스틱은 놓치고 헬멧은 벗을 수도 없다.
김 코치는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링크로 나가 봅시다”라고 말한 뒤 링크 쪽으로 인도했다. 이미 선수들은 링크에 마련된 의자와 벤치에 앉아서 훈련을 기다리고 있다.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 한 선수가 소리친다.
“얘들아 오늘 기자님 나오셨다. 아이스하키가 뭔지 제대로 보여 드려. 바디 체킹은 기본인 것 알지. 오늘 세게 한번 가자.”
‘잘못하면 오늘은 체험으로 하루를 끝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선수들이 먼저 링크로 나가자 김 감독이 “아니 뭐하세요. 빨리 나오세요”라고 재촉한다. 장비 착용으로 이미 힘이 빠진 나는 넋을 놓고 있다 얼음판에 첫발을 내디뎠다.
‘휘청.’ “발목에 힘주세요. 아니면 계속 넘어지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김 감독이 첫 번째 주문을 한다. 선수들이 몸을 풀며 링크를 돌기 시작하자 김 감독이 본격적인 훈련 시작을 알린다. “일단 스케이트 실력부터 봅시다. 한쪽에서 왔다갔다 해보세요.”
김 감독의 말에 얼음을 지쳐봤다. 오랜만에 얼음판에 선 터라 얼음을 지치지 못하고 아기가 걸음마 하는 수준. 몇 차례 어색한 자세로 스케이트를 타다가 감각이 돌아오면서 얼음을 본격적으로 지쳤다. “생각보단 괜찮아요. 그럼 이제 턴 동작을 해볼까요.”
김 감독의 두번째 지시가 떨어졌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턴은 어색하지만 그런대로 따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문제가 됐다. 발을 옮기려하니 중심이 무너져 연거푸 빙판에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스하키는 턴이 생명이에요. 특히 시계 방향으로 턴하는 게 돼야 기술을 부릴 수 있어요.” 몇 번 얼음을 지쳤을 뿐인데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됐다. 링크는 썰렁하지만 꼭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다.
이어 드리블 훈련이 시작됐다. 김 감독의 시범을 본 뒤 제자리에서 일단 퍽을 드리블 해본다. 스틱이 익숙치 않은 탓에 한번 친 퍽은 멀찌감치 도망 가버린다. 이 모습을 본 김 코치 “드리블은 양 발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벗어나면 안 돼요”라고 한마디.
김 코치의 말대로 훈련해보지만 퍽은 내 마음과 달리 자꾸 도망가고 만다. 퍽을 쫓아가보지만 이번엔 스케이트가 말을 안 듣는다. 퍽을 지나쳐서야 멈춘다. 슬슬 허리가 아파오고 다리에 힘도 빠진다. 잠깐 잠깐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꾀를 부린다. “최 기자님 뭐 해요. 드리블!” 한 선수가 김 감독과 김 코치도 들리게 나를 압박한다.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다시 드리블 시작.
10여분 했을까. 조금씩 스틱을 다루는 게 익숙해진다. 퍽도 많이 도망가지 않는다. 김 감독은 한 선수와 패스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 제자리에서. 스틱이 익숙해지면서 짧은 거리의 패스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단지 제자리에 서 있기 위해 힘을 주다보니 허리와 발목에 통증이 조금씩 강해진다.
이윽고 움직이면서 패스하기. 한 선수가 정확하게 패스해주지만 내가 패스를 시도하자 퍽은 저 멀리 도망가거나 힘이 없어서 50cm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선수가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힘을 주어 세게 패스하니 방향이 어긋난다. 그러나 역시 선수들은 달랐다. 도망가는 퍽을 잡아 다시 나에게 정확하게 연결해 주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앞으로도 1시간이 더 남았다. 이미 체력은 고갈됐고, 온 몸은 땀으로 흥건하다. 허리와 발목의 통증은 가시지 않는다. 결국 플레이어는 포기.

장비를 다 착용하고 다시 링크로 복귀. 두꺼운 정강이 보호대 때문에 팔자걸음이 불가피 하다. 링크 출입문에서는 정강이 보호대가 걸려 넘어질 뻔 했다.우여곡절 끝에 링크 도착.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기자님이 골리 본단다. 슈팅으로 헬멧 좀 맞혀 드려.”
무슨 소린지 몰라 김 코치에게 물어보니 “경기 중에도 골리의 혼을 빼놓기 위해 일부러 마스크 쪽으로 강하게 슈팅을 하곤 한다”고 대답했다.“난 이제 죽었다.” 김 감독이 나를 보며 말한다.“자 기본자세부터 익힙시다.”
빙판 한쪽에 서서 기본 자세를 배웠다. “자 스틱으로 발 사이를 가리고, 글러브는 가슴 높이로 벌리고, 허리는 숙이고. 해 봅시다.” 영 자세가 어색하다. 김 감독은 퍽을 몇 개 가지고 오면서 “글러브로 잡아봐요”라고 주문. 글러브 안에 퍽을 정확하게 넣어주지만 연신 놓친다. 야구 글러브와는 차원이 다르다. 어느 정도 자세를 잡으니 골문 앞에 서라고 한다.
두려운 마음도 컸지만 골문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선수들에게 슈팅을 주문한다. 고맙게도 선수들은 강한 슈팅을 시도하지 않는다. 정강이 보호대, 글러브가 있는 쪽으로 슛을 날려준다. 한 선수가 왼쪽 위로 슛을 날린다. 머리에 맞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지켜보던 다른 선수들이 ‘까르르’ 웃는다.
비록 정식 경기는 하지 못했지만 왜 아이스하키가 힘든지, 선수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무사히(?) 체험을 마치고 모든 장비를 벗어 던지자 몸이 날아갈 것 같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김 감독이 한 마디 던지며 웃는다. “한 번으로 되나요. 종종 오세요. 더 세게 한번 해야지.”
“감독님 제가 훈련 방해하면 쓰나요. 한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곤 재빠르게 링크 밖으로 줄행랑을 쳤다. 그렇게 아이스하키 체험은 막을 내렸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사진 =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관련기사]동호회 100여개…‘귀족 스포츠’ 쿨한 변신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5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6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7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8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9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10
[오늘의 운세/2월 2일]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5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6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7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8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9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10
[오늘의 운세/2월 2일]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76630.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