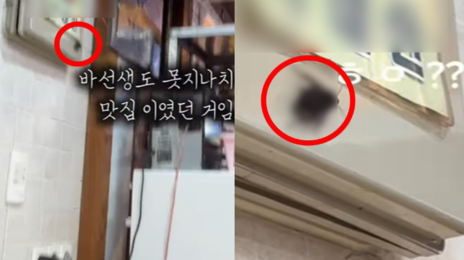공유하기
[25시]‘제2 김연아’가 나오려면…
-
입력 2008년 3월 25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정확한 수효를 알 리 없는 선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협회 관계자가 알려주기도 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아사다 마오(일본)는 수천 명이라고 대답했다. 2위 카롤리나 코스트네르(이탈리아)는 수백 명 이라고 답했다. 이제 동메달을 딴 ‘피겨 요정’ 김연아(18·군포 수리고) 차례.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 ‘10명 정도’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세계 각국 기자들의 얼굴에는 의아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지금은 세계 피겨 강국으로 인정받는 일본도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온 뒤에야 큰 발전을 이룩했다.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일본에 첫 메달을 안긴 이토 미도리의 등장 이후 일본의 피겨 문화는 달라졌다. 한 명의 천재가 전체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다.
일본은 그로부터 14년 뒤인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아라카와 시즈카가 금메달을 땄다.
김연아의 등장으로 국내 피겨계는 10년 뒤 ‘제2의 김연아’ ‘제3의 김연아’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다른 점이 있다. 김연아는 국내에서 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해봐서…”라며 말을 흐렸다. 그의 머릿속엔 콩나물시루 같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여러 선수와 몸을 부딪치며 훈련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김연아 한 명만 바라보며 국내 피겨의 발전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예테보리=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트렌드뉴스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3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장기 투자자… 20~30대 수익률의 2배
-
4
“코스피 5000? 대선 테마주냐” 비웃던 슈카, 이제는…
-
5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6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7
수용번호 ‘4398’ 金, 선고 순간 차렷자세 무표정
-
8
양주서 60대 흉기 찔려 숨진채 발견…30대 아들 피의자 체포
-
9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
10
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분실한 檢, 관련 수사관 감찰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3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4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5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6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9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10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트렌드뉴스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3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장기 투자자… 20~30대 수익률의 2배
-
4
“코스피 5000? 대선 테마주냐” 비웃던 슈카, 이제는…
-
5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6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7
수용번호 ‘4398’ 金, 선고 순간 차렷자세 무표정
-
8
양주서 60대 흉기 찔려 숨진채 발견…30대 아들 피의자 체포
-
9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
10
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분실한 檢, 관련 수사관 감찰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3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4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5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6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7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8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9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10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