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스룸/정양환]그들이 바다에 대처하는 자세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14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묘한 ‘특별판’ 하나를 내놓았다. 태블릿PC 독자를 위한 스페셜 에디션인데, 1962년 발행호를 디지털 복원한 것이다. 최신 사안을 다루는 시사지가 뜬금없이 반세기 전 잡지를 재발간한 이유가 뭘까. 타임 측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3년 출범한 타임은 최근 그간의 모든 기사를 디지털화한 기념으로 당시 혁신적이었던 1962년 3월 2일호를 다시 출간합니다. 여기엔 현재 공화당 대권후보 누군가의 아버지인 조지 롬니가 주지사 선거에서 모르몬교도여서 논란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해 세계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돈 존 글렌 전 상원의원을 다룬 커버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지구는 우주란 새로운 바다를 발견했다. 미국의 역할은 닻을 올리고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러하듯이.”
우연의 일치일까. 같은 날, 다른 미 언론에도 ‘미국의 역할’과 ‘혁신’이란 표현이 함께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된 서평으로, 영국의 한 역사학자가 쓴 ‘제국의 망령(Ghosts of Empire)’에 대한 기사였다.
WSJ가 지적하는 문제란 ‘미국과 영국의 차이’다. “물론 현실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당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자유시장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많은 나라다. 세계 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혁신을 꿈꾸고 있다.”
두 매체의 속내는 명확지 않다. 하지만 최근 미 정가에서 ‘미국의 역할’은 뜨거운 이슈다. 이라크 철수나 군비 축소 등을 이끈 현 정부가 자국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킨다는 주장이다.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커지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최근 “우리 지도자는 미국이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논쟁을 거들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 연설에서 “쇠퇴를 거론하는 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미국의 리더십은 회복됐다. 미국은 다시 돌아왔다”고 응수했다.
솔직히 말하자. 팍스 아메리카가 건재할지 못할지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 하지만 좋건 싫건,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다. 물론 공적만큼 과오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신했으면 더 나아졌을 거라 상상하긴 힘들다. ‘제국의 망령’에도 엇비슷한 대목이 나온다. “어느 시대를 봐도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는 있었다. 벨기에 제국이 흥했던들 다른 세상이 펼쳐졌을까. 대영제국은 존재했고 그 가치를 부정할 순 없다.”
정양환 국제부 기자 ray@donga.com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도언의 마음의 지도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트렌드뉴스
-
1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2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3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4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5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6
“다림질 태운 셔츠가 150만원”…하이패션 또 도마
-
7
“예쁘니 무죄?”…범죄보다 ‘외모’에 쏠린 韓日의 위험한 열광
-
8
“지선앞 징계가 웬말이냐”에…당권파, ‘장동혁 사퇴요구’ 친한계 윤리위 제소
-
9
마약왕 사살에 멕시코 총기 폭동…홍명보호 ‘비상’
-
10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트렌드뉴스
-
1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2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3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4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5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6
“다림질 태운 셔츠가 150만원”…하이패션 또 도마
-
7
“예쁘니 무죄?”…범죄보다 ‘외모’에 쏠린 韓日의 위험한 열광
-
8
“지선앞 징계가 웬말이냐”에…당권파, ‘장동혁 사퇴요구’ 친한계 윤리위 제소
-
9
마약왕 사살에 멕시코 총기 폭동…홍명보호 ‘비상’
-
10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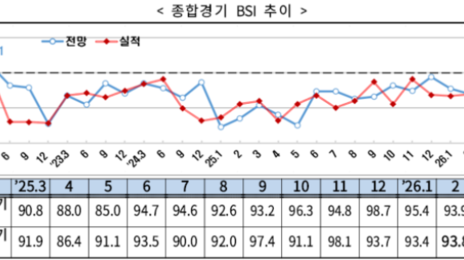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