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이형삼]헝가리안 랩소디의 달콤한 복지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1992년 여름 헝가리에서 2주 남짓 머물렀다. 수도 부다페스트를 가로지르는 다뉴브 강 양안엔 고딕 바로크 네오르네상스 양식을 아우르는 왕궁 교회 미술관이 즐비했다. 중심가는 현대식 건물들이 반들반들한 속살을 드러내며 신구(新舊)를 대비시켰다. 바치 거리의 젊은이들은 뉴욕 소호 거리의 청년들처럼 세련되고 활기차 보였다. 3년 전까지 소련의 통제를 받던 공산국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헝가리 민족인 마자르족은 아시아에서 건너간 말갈족으로 알려져 있고 헝가리어는 한국어와 같은 우랄알타이계다. 마늘과 고추를 듬뿍 넣은 얼큰한 음식도 즐긴다. 친근감을 더한 건 우리만큼이나 강렬하고 역동적인 국민 정서다. 몽골 터키 소련 등의 침탈을 견뎌내며 쌓인 한(恨)과 저항정신에서 비롯된 듯했다. 그런 열정으로 1988년 동유럽권 최초로 경제개혁을 선언하고 2000년대 초까지 연 5%대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1989년 공산국 중 처음으로 한국과 수교한 것도 남다른 인연이다.
닮은꼴은 또 있다. 한국과 헝가리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 2위다. 국가행복지수는 한국이 30개국 중 25위, 헝가리가 29위다. 남성 암(癌) 사망자 비율은 헝가리가 1위, 한국이 5위다. 헝가리 성인의 70%는 매일 술을 마신다. 다혈질의 정한(情恨), 급속한 경제성장과 체제전환 스트레스가 주원인일 것이다. 자기주장이 강해 타협보다 분열에 익숙한 성향은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를 떠오르게 한다.
포퓰리즘이 낳은 괴물이 지금 헝가리를 유린하고 있다. 2010년 주택담보대출 가구 구제 등 비현실적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중도우파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일당독재를 노리고 있다. 그가 지난달 선포한 ‘기본법’은 야당 집권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거구 획정, 사법부 기능 축소, 중앙은행 무력화, 좌파 정당 탄압 등 초헌법적 조항을 담았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도 퍼주기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뒤로는 독재자의 길을 닦고 있다. 더러 반독재 시위가 벌어지지만 ‘칼끝에 묻은 꿀’에 중독된 다수는 침묵하고 있다.
‘헝가리안 랩소디’는 헝가리 국민작곡가 프란츠 리스트의 대표작이다. 화려하고 정열적인 음색이 혼을 쏙 빼놓는다. 대중적 인기는 높지만 이론과 형식에서 벗어난 즉흥성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리스트는 자신의 피아노 연주회에서 현란한 기교를 과시해 청중을 단번에 매료시킬 의도로 이 곡을 만들었다. 포퓰리즘의 예술적 승화다.
복지는 예술이 아니다. 뒷감당을 따져봐야 한다. 복지예산을 비롯한 재정의 대원칙은 ‘양출제입(量出制入)’이다. 지출을 먼저 계산해서 수입, 즉 과세액을 정한다. 반대로 수입이 일정한 가계(家計)에선 수입에 맞춰 지출을 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을 한다.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내놓을 때는 ‘양입제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면 좋겠다. 대학을 가도 돈, 안 가도 돈, 군대에 가도 돈, 취직을 못해도 돈을 준다니 어느 곳간에서 돈을 빼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푸드 NOW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지금, 이 사람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2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3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4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5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6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7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8
알몸 목욕객 시찰한 김정은 “온천 휴양소 개조 보람있는 일”
-
9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10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트렌드뉴스
-
1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2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3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4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5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6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
7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8
알몸 목욕객 시찰한 김정은 “온천 휴양소 개조 보람있는 일”
-
9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10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이것’ 가능성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7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8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9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이세형]트럼프 남은 임기 3년이 더 긴장되는 이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0/13319835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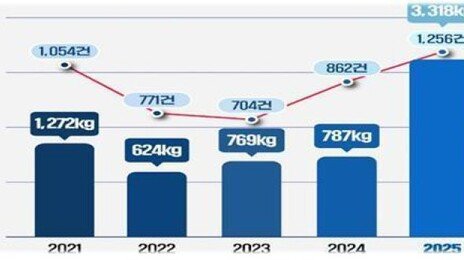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