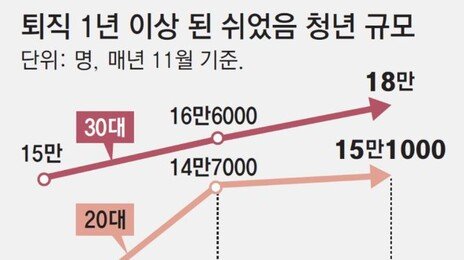공유하기
日 의원세습은 ‘시니세’?
-
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허약한 정치인 양산” “그래도 유권자가 선택” 해석 부분
일본 정가에서 ‘세습’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신임 내각의 각료 18명 중 13명이 세습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28일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차남 신지로(進次郞) 씨를 후계자로 내세워 또 한 차례 도마에 올랐다.
▽‘총리 손자들의 대결’=일본 신문들은 2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의 대정부질문을 보도하면서 ‘손자들의 대결’이란 제목을 뽑았다.
아소 총리의 외조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와 하토야마 간사장의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 전 총리는 1950년대 총리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겨룬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이다.
정치 명문가의 영향력은 고이즈미 총리 이래 아베 신조(安倍晋三)-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아소로 이어지는 4명의 총리가 대표적 세습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를 두고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대표대행은 “자민당은 총리의 아들 손자가 아니면 총리가 될 수 없나”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남 말할 처지는 아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부터 부친(오자와 사에키·小澤佐重喜)에게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27세에 금배지를 단 세습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세습의 장단점=일본에서 세습 정치인은 1980년대 중반 급격히 늘었다. 현재의 중의원을 보면 자민당은 3분의 1 이상, 민주당도 약 10%가 세습 의원이다.
정치 세습은 대개 곱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연달아 불쑥 사임한 아베, 후쿠다 전 총리가 모두 명문가의 세습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세습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정치인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습이 비난받는 이유는 여럿이다. 지역사회의 각종 이권구조를 유지하는 구조가 되고 불공정 경쟁으로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것.
세습 의원들은 일본 정치에서 꼭 필요하다는 3반, 즉 지반(ちばん·지역기반) 간판(かんばん·지명도) 가방(かばん·자금)을 일찌감치 손에 넣어 젊어서부터 금배지를 다는 반면, 바닥부터 기어 올라간 정치인들은 무리하다 보면 각종 리스크를 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정치가 이미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업종이 됐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없어 세습이 이뤄진다는 일종의 ‘시니세(老鋪·오랜 가업)’ 개념도 나오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