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드-사르트르-카뮈 등 책 펴낸 佛갈리마르 출판사 100돌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이 출판사 없인 佛 문학 없다” 프랑스 전역 기념행사로 들썩
《앙드레 지드, 장 폴 사르트르, 알베르 카뮈, 시몬 드 보부아르, 마르셀 프루스트, 앙드레 말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프랑스 문학사를 수놓은 쟁쟁한 이 작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출판사를 통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바로 갈리마르 출판사다. 갈리마르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포크너, 프란츠 카프카 같은 비(非)프랑스 작가들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데도 앞장섰다. 이 출판사를 언급하지 않고 현대문학사와 지성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다. 사람들은 그런 갈리마르를 ‘문학의 팡테옹’(만신전)으로 불렀다.》
올해는 가스통 갈리마르라는 청년이 지드와 함께 갈리마르 출판사를 세운 지 100주년이 되는 해. 프랑스에선 기념행사가 한창이다. 아르테TV는 갈리마르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파리의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선 갈리마르가 보관해온 사료들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파리 시내 극장에선 가스통 갈리마르가 작가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읽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9월에는 파리역사도서관에서 갈리마르를 통해 알려진 작가들의 초상을 내거는 전시회가 개막한다. 모두 ‘갈리마르’라는 이름이 갖는 권위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행사는 BNF 전시회. 갈리마르는 프루스트의 ‘스완네 집 쪽으로’, 지드의 ‘위폐범들’, 말로의 ‘인간의 조건’, 사르트르의 ‘구토’ 등 유명 작품의 친필 원고를 내놓았다. 생텍쥐페리가 직접 그린 ‘어린 왕자’ 수채화도 내걸었다. 장 콕토가 갈겨쓴 편지, 장마리 귀스타브 르 클레지오가 22세 때 보내온 원고도 전시 중이다. 전시회가 풍성해진 것은 일찌감치 자료의 중요성을 간파한 가스통 갈리마르가 작가들에게 “아무 것도 버리지 말고, 찢지 말고, 태우지 말라”면서 자료를 출판사로 보내 달라고 주문한 덕분이다.
갈리마르의 독특한 ‘독자위원회’ 제도도 빼놓지 않고 언론들은 언급했다. 어떤 원고를 책으로 낼지 결정하는 위원회로 지드, 모리스 블랑쇼, 카뮈, 폴 엘뤼아르, 장 그르니에 등 쟁쟁한 작가들이 위원회를 거쳐 갔다. BNF 전시회에는 위원들의 평가를 적은 쪽지도 전시되고 있다. 비평가 장 폴랑은 1941년 카뮈의 ‘이방인’ 원고가 접수되자 ‘대단한 작품이다. 주저 말고 출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말로는 1935년 포크너의 소설을 받아들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의 모든 소설에 1등급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는 가스통 갈리마르를 가리켜 렉스프레스는 1935년 기사에서 ‘미래의 작가들이 옹알이를 하는 수준에 있을 때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출판사의 권위는 흔들림이 없다. 르 클레지오는 200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을 때 갈리마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해 ‘공산정권 부역’ 시비에 휘말렸던 밀란 쿤데라는 갈리마르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작품 가운데선 김훈의 ‘칼의 노래’와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등이 갈리마르를 거쳐 프랑스에 선을 보였다.
갈리마르의 대표작들은 국내에도 꾸준히 번역 출간돼 문학 전공자나 소설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장은수 민음사 대표는 “지식사회의 첨단을 달리면서도 전통과 품위를 유지해온 출판사이자,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출판사”라고 평가했다.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5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국힘 간판으론 어렵다?…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국힘 13명
-
8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9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만났다
-
10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1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2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5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6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7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8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9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0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5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국힘 간판으론 어렵다?…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국힘 13명
-
8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9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만났다
-
10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1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2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5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6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7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8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9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0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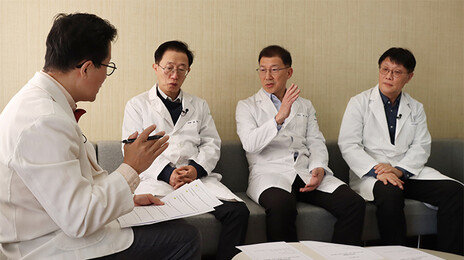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