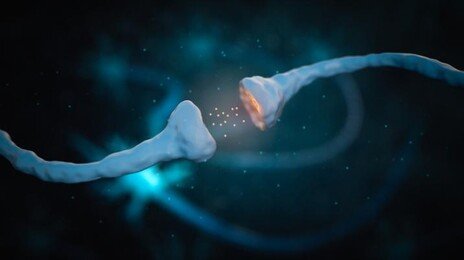공유하기
[6·25전쟁 50년]김윤식/우리 문학속의 6·25
-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글자크기 설정
▼영혼 고무시키는 '깊이의 문학'▼
인간의 위엄에 어울리는 그러한 목소리, 그러한 몸짓, 그러한 감각이 한(恨)의 형태를 띠고 이 나라 문학의 전통으로 형성되어 왔고 그 연장선상에 분단문학이 위치한다. 우리 문학사를 두고 사람을 위로하고 또 즐겁게 하는 쪽이기보다는 우리를 고무케 하는 ‘깊이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문맥에서다.
고전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광장’(최인훈,1960)의 주인공 이명준이 북쪽도 남쪽도 동시에 거부했을 때 그의 앞에는 자살의 길밖에 없었다. 흑인병사의 씨를 낳은 며느리와 인민군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노모가 있는 ‘아베의 가족’(전상국, 1979)도 그러한 사례를 웅변하고 있다. 이 고통의 형식이 우리를 고무케 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언어적 미학적 장치를 통해 우리의 때묻은 일상적 혼을 정화(淨化)시키는 역할을 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기에도 맹점은 있었다. 이미 강조된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식 문학의 전통성은 민족주의 그것이 지닌 고약한 ‘배제의 원리’의 일종이 아니었던가. 우리끼리만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해탈이 아니었던가. 이를 어느 수준에서 비판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세계성에 이를 수 없다. 쉽사리 그 극복방식이 열리지 않겠지만, ‘장마’(윤흥길, 1973)는 그 한 가지 방도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두 청년이 있었다. 한 청년은 소년의 삼촌, 다른 청년은 외삼촌이었다. 동시에 한쪽은 국군장교 후보생이었고, 다른 한쪽은 빨치산이었다. 6·25의 한가운데라면 삼촌이 외삼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양쪽이 시차를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죽음을 가능케 한 분위기를 상징한 것이 장마였다. 그것은 하늘의 행위여서 인간이 관여할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을 살아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온당할까.
이 물음에 작가는 민첩하게도 구렁이 민담을 도입해 답을 대신했다. 원혼은 저승으로 갈 수 없다는 것, 구렁이로 환생하여 삶 속에 개입한다는 것, 이를 달래는 노력과 절차 없이는 결코 산 자의 평온이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감각을 굿의 형식으로 다듬은 것은 이 나라 선인들의 슬기였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국적인 것인 동시에 동북아(東北亞)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민담, 그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이 고층적 감각이 이른바 발견으로서의 기법이다. 작가의 명민성에 앞서 이 나라 문학사의 역량에서 나온 기법이기에 그만큼 값졌다.
민족문학으로서의 분단문학이 제일 날카롭게 인식되어, 문학판의 한가운데 놓였던 시기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놓였던 1960, 70년대였다.
▼민족주의에서 평등으로▼
문학이 거의 막바로 정치적 열정의 방수로(放水路) 몫을 했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옮겨오면서 이 나라의 문학적 역량은 다시 한번 그 인간의 위엄에 어울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갔다. ‘사람은 벌레가 아니다’라는 명제로 수렴되는, 이른바 민중 노사문학이 그것. 민족주의의 맹점인 배제의 원리를 넘어선 평등원리에 바탕한 새 과제를 맞아 문인들만큼 민첩한 경우가 달리 있었을까.
상상력으로서의 분단문학은 이 때 사실상 종언(終焉)을 고했다. 그 덕분에 우리 문학은 드디어 ‘사람은 벌레다, 연어다, 메뚜기다’의 명제로 수렴되는 새로운 경지에 진입했다. ‘사람은 벌레다’와 ‘벌레가 아니다’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21세기적 과제라면, 그리고 새로이 시작될 ‘화해의 문학’도 이 과제 속에 내속(內屬)되는 것이라면, 분단문학은 화해의 문학과 더불어 두 세기를 동시에 살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아닐 수 없다.
김윤식<문학평론가·서울대교수>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3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6
트럼프 손등에 또 멍자국…“테이블에 부딪혔다” 해명
-
7
“주인 찾아 260km 국경 질주” 5개월 만에 고양이가 돌아와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0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3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6
트럼프 손등에 또 멍자국…“테이블에 부딪혔다” 해명
-
7
“주인 찾아 260km 국경 질주” 5개월 만에 고양이가 돌아와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0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