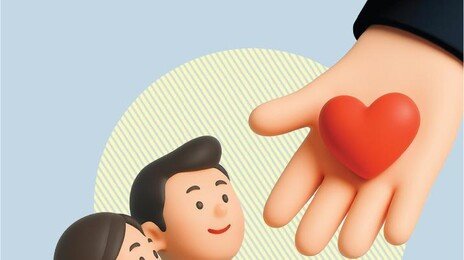공유하기
[인문사회]원근법으로 살펴본 日근대 '표상공간의 근대'
-
입력 2002년 3월 1일 17시 49분
글자크기 설정

미셸 푸코의 명저 ‘말과 사물’이 벨라스케즈의 그림 ‘시종들’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듯이 이 책은 메이지 시대 일본의 전쟁을 그린 두 장의 유화(油畵)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두 장의 그림에서 저자가 본 것은 전쟁의 현장성을 담아낸 새로운 풍경이다. 형이상학적 모델에 입각해 명승고적을 재현하는 관습적 풍경이 아니라, 공간적 깊이와 사실적 현장성을 포착한 ‘익명적 풍경’이 그것이다. 새로운 풍경이란 세계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저변에는 원근법이 풍경 발견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그림에만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다면 회화 기법의 변화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풍경은 동시대에 출간된 소설의 묘사에서도 발견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말과 글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원근법이 소실점에 근거하듯이 소설은 중립화된 시점(視點)과 종결어미를 통해서 새로운 풍경을 묘사한다.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과정에서 풍경이 발견됐듯이, 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언문일치(言文一致)가 언어의 새로운 규칙으로 모색된다. 원근법 시점 언문일치는 근대적 표상공간의 공통적 코드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근법으로 대변되는 근대의 코드들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뉴턴적 의미에서의 균질적 공간이다. 저자가 말하는 균질적 공간은 어느 곳에서든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는 기하학적 평면(平面)과 아주 유사하다. 이 지점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실제로 균질적 공간이 돌출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이 종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조화됐다는 의미다.
원근법과 언문일치가 개인적 차원에서 근대적 의식을 규정하는 표상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호주관(相互主觀)적으로 공유될 수 있었을까. 이는 다양한 감각적 정보들을 단일한 코드로 저장하고 번역하고 분배하는 매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음성은 속기술(언문일치)에 의해서 문자 형태로 저장됐다가, 시각화된 기호의 모습으로 번역돼 신문 기사로 옮겨진다. 근대적 인쇄복제기술에 의해 대량 생산된 신문(동일한 텍스트)은, 철도를 근간으로 하는 교통망을 통해서 배포되고, 교육제도가 양성해 낸 근대적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대중매체와 사회제도를 통해서 확대된 균질적 공간은 국민국가(nation-state)의 영역과 겹친다. 원근법의 소실점에 해당하는 자리에 천황이 놓이고, 천황의 초월적 시선 아래 모든 사람은 ‘일본인’이라는 균질적 주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근대의 균질적 표상공간은,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인식의 방법이자, 매체와 제도를 통한 사회의 체계화 원리이며, 동시에 국민국가라는 상상적 공동체의 상호주관적 토대라는 중층적 의미를 갖는다.
거칠게나마 살펴본 전체적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구성은 작은 실마리에서 출발해 사건의 전체적인 면모를 밝혀내는 추리소설의 방식과 흡사하다. 또한 근대성과 관련해 일본의 학계와 비평계가 축적해 온 이론적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근대의 표상공간이라는 전체적 기획으로 통합해 내는 저자의 안목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강상중 윤건차 이연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축적해 온 문화적 역량과 재일동포로서 저자가 가졌던 문제의식이 행복하게 (동시에 고통스럽게) 만난 경우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근대성의 세부 주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동시에 근대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표상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매개(론)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책에서 표상은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인식의 구조이며, 그와 같은 인식구조에 의해서 산출된 텍스트를 말한다. 또한 텍스트의 소통, 전달, 분배와 관련된 미디어와 제도의 차원 역시 표상에 해당한다. 이런 표상들이 균질적 공간을 형성하는 동시에 균질적 공간 내부에 새로운 방식으로 배치되는 역사적 과정이 바로 근대인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 나는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균질적 표상공간과 비(非)균질적 경험공간(생활세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균질적 표상공간과 억압적 국가기구(천황제)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생활세계적 경험의 위상은 균질적 공간의 어느 지점에 설정되어야 할까.
다른 하나는 압축적 근대와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이다. 이 책은 메이지 후반기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르네상스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시기와 지역을 다루고 있는 서구의 이론을 동원한다. 그 결과 일본과 서구의 유비적 동일성(균질성)이 검증된다. 하지만 통합적인 설명모델에 대한 강박관념은 역으로 통합적인 서구의 근대라는 환상적 이미지를 만들고 더 나아가 오리엔탈리즘의 강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물음이 결코 이 책에 대한 일방적 추궁일 수는 없다. 한국의 근대성을 탐색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게도 배분되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에 대해서 몇 마디 덧붙이겠다. 일본의 전통예술의 명칭과 작가와 작품들이 불러일으키는 원문의 생경함은, 일본어 독해에 능숙한 사람도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상세한 주석과 함께, 번역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세련된 문장을 보여준 역자에게 감사를 보내고 싶다. 저자의 문제의식과 역자의 노고가 짙게 밴 이 책이 국내의 근대성 연구에 생산적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언젠가는 글로 쓰고 싶었던 내용을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읽게 될 때의 씁쓸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책이어서일까. 우연한 기회에 역자를 만나게 된다면 술 한 잔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김동식 서울대 국문학과 강사·문학평론가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하메네이 제거하고 중국 오는 트럼프…시진핑 웃을 수 있나
-
4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5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6
日대표팀 회식비, 최고 연봉 오타니가 아닌 최저 연봉 스가노가?
-
7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8
英기지 내어주고 佛해군 파견…‘이란 공습’에 유럽 가세
-
9
이란 혁명수비대 “네타냐후 집무실에 탄도미사일 공격” 주장
-
10
돼지수육 본 김 여사 “밥 안 주시나요?”…싱가포르서 제주 음식 ‘감탄’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8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
9
순방 가서도 ‘부동산’…李 “韓 집값 걱정? 고민 않도록 하겠다”
-
10
[사설]美, 이란 하메네이 제거… 세계를 뒤흔든 난폭한 ‘힘의 시대’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하메네이 제거하고 중국 오는 트럼프…시진핑 웃을 수 있나
-
4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5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6
日대표팀 회식비, 최고 연봉 오타니가 아닌 최저 연봉 스가노가?
-
7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8
英기지 내어주고 佛해군 파견…‘이란 공습’에 유럽 가세
-
9
이란 혁명수비대 “네타냐후 집무실에 탄도미사일 공격” 주장
-
10
돼지수육 본 김 여사 “밥 안 주시나요?”…싱가포르서 제주 음식 ‘감탄’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8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
9
순방 가서도 ‘부동산’…李 “韓 집값 걱정? 고민 않도록 하겠다”
-
10
[사설]美, 이란 하메네이 제거… 세계를 뒤흔든 난폭한 ‘힘의 시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오늘과 내일/김현수]AI에 쓸모 잃은 인간, 섬뜩한 무용계급론](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50335.1.thum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