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원성 스님의 그림 에세이집 '거울'
-
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1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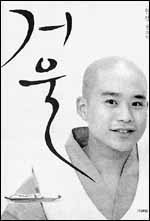
원성 스님한테 작은 거울 하나를 선물받았다. 그 거울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처음에는 내 더러운 마음이 비쳐질 것 같아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쉰이 넘도록 마음의 거울 하나 지니지 못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 소중히 받아들었다.
어제는 그 거울 앞에 발가벗고 하루종일 서 있었다. 처음에는 내 더러운 모습이 비칠 것 같아 비오는 날 마루 밑에 숨은 생쥐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더러운 내 마음은 비쳐지지 않고 맑고 깨끗한 원성스님의 마음의 모습만 비쳐졌다.
원성 스님의 마음은 엄마 품에 안겨 엄마 얼굴을 바라보는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닮아 있다. 나도 모르게 그의 마음 한 조각을 훔쳐 먹어보았다. 맑은 냇물 맛이 났다. 여름날, 냇가에 발을 담그면 피라미들이 내 발을 톡톡 건드렸는데, 원성 스님의 아기 같은 마음이 자꾸 내 발가락을 톡톡 건드린다.
수도자들은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수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세속의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순수한 삶을 대신해서 살기 때문이다.
원성 스님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남을 위해 산다. 그의 그림은 우리들 영혼의 제 모습을 보여준다.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마음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준다. 그의 그림 속에 사는 동자승은 바로 우리가 버려버린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가 버려버린 소년의 마음을 냇물에 깨끗이 헹구고 햇볕에 말린다. 우리 모두 달려나가 소중하게 두 손 벌려 받을 일이다.
원성 스님의 그림이 감동을 주는 까닭은 아무래도 동자승의 그 티없이 맑은 눈빛 때문이다. 동자승은 엄마가 보고 싶어 금방이라도 눈물을 툭 떨굴 것만 같다. 동자승과 눈을 맞대고 있으면 어느새 영원에 가 닿는 듯하다. 어디선가 한 마리 새가 날아오를 듯하고, 한 포기 향기로운 풀꽃이 피어오를 듯하다.
이 책에 실린 원성스님의 글은 저녁 무렵 동구 밖에 나가 외갓집에 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착한 아이의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스님의 글을 읽다가 고개를 들면 어느 새 먼동이 터오고 나는 한없이 착한 인간이 되어 있다.
‘거울’에서 딱 한 편의 글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 ‘공중전화’를 고르겠다. 원성스님은 다른 스님들이 다 잠든 밤에 몰래 일어나 일주문까지 달려나가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그리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눈물을 글썽인다. 이 얼마나 승속을 넘나드는 인간의 마음인가.
올여름에 나 자신을 바로볼 수 있는 ‘거울’ 하나를 제대로 지니게 되어 기쁘다. 원성 스님을 일컬어 ‘산사의 어린 왕자’라고 한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진실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원성 스님은 그의 글과 그림을 통해 진실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풍경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산사에 가야 한다. 그러나 이제 굳이 산사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원성 스님의 ‘거울’을 보면 아파트에 살면서도 달빛 소리 같은 풍경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 자신이 그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정호승(시인)
스타일 >
-

딥다이브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트렌드뉴스
-
1
성공하면 ‘돈벼락’…그리스 선박 10척, 위치정보 끄고 호르무즈 야밤 통과
-
2
강남 아파트보다 소박한 일론 머스크 집…수건은 한 장, 주방도 단촐
-
3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4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5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8
“비행기 타려면 좌석 두 개?”…美 항공사 정책 시끌
-
9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0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5
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
6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7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8
‘절윤’ 선언에도 국힘 지지율 20%… 張 취임후 최저
-
9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0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트렌드뉴스
-
1
성공하면 ‘돈벼락’…그리스 선박 10척, 위치정보 끄고 호르무즈 야밤 통과
-
2
강남 아파트보다 소박한 일론 머스크 집…수건은 한 장, 주방도 단촐
-
3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4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5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8
“비행기 타려면 좌석 두 개?”…美 항공사 정책 시끌
-
9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0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5
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
6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7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8
‘절윤’ 선언에도 국힘 지지율 20%… 張 취임후 최저
-
9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0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