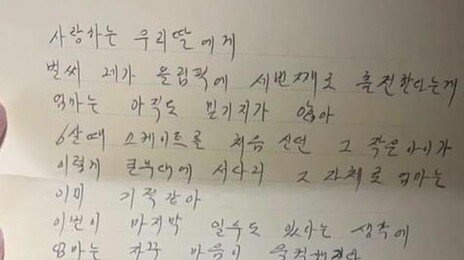공유하기
[오주석의 옛그림읽기]이정의 '風竹圖'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글자크기 설정
잎은 위로 갈수록 더 짙고 무성하며, 낭창낭창한 잔가지는 탄력 속에 숨은 생명의 의욕으로 넘실댄다. 그렇다. 첫 눈에 가득했던 것은 거친 바람이었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끈질긴 대나무의 정신이다.
대나무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사람이다. 그것도 대단히 어진 사람이다. 식물을 어째서 사람, 그것도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가. 다섯가지 훌륭한 덕을 지녔기 때문이다.
첫째, 대나무는 뿌리가 굳건하다. 어진 이는 그 뿌리를 본받아 덕을 깊이 심어 뽑히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둘째, 줄기가 곧다. 몸을 바르게 세워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는다. 셋째, 속이 비었다. 텅 빈 마음으로 도를 체득하며 허심으로 남을 받아들인다. 넷째, 마디가 반듯하고 절도가 있다. 그 반듯함으로 행실을 갈고 닦는다. 그리고 다섯째, 사계절 푸르러 시들지 않는다.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지녔다.
대나무는 대인군자의 상징이다. 그래서 대개 점잖은 먹빛으로 그린다. 어떤 이가 빨간 대를 그렸다. 사람들이 “세상에 빨간 대가 어디 있느냐”고 힐난했다. 그러자 그는 “그럼 새까만 대나무는 어디에 있소” 하고 대꾸하였다. 대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색과 모양을 넘어선 정신이다. 낙백(落魄)한 선비처럼 비를 맞고 축 처진 대나무, 미소년처럼 환해 보이는 아지랑이 속의 대나무, 역경을 이겨내는 지조인 양 차가운 백설에 잎새가 눌려 있는 대나무, 그렇게 대그림에서는 정신이 느껴져야 한다. 통 굵은 늙은 대나무가 가운데 토막에서 퍽 소리를 내고 터져 분질러진 것을 보면 비장함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
대나무는 군자다. 죽순은 음식이 되고 죽공예품은 삶을 돕는다. 쪼개면 책(죽간·竹簡)이 되고, 잘라 구멍을 내면 율려(律呂)의 악기가 되어 우주의 조화에 응한다.
대나무의 조형은 너무나 단순하다. 줄기와 마디와 잔가지와 이파리, 그것이 대나무의 모든 것이다.
그런 대를 옛사람들은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것이라 일러 왔다. 줄기 하나, 이파리 하나를 이루는일획을 잘 긋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획 하나를 잘 그으면 열 획, 백 획이 다 뛰어나다. 그 일획 속에 바람이 있고 계절이 있고 말로는 다 못할 사람의 진정이 있다.
오주석(중앙대 겸임교수) josoh@unitel.co.kr
김정운교수의 여가클리닉 >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트렌드뉴스
-
1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2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3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6
트럼프 폭주 “바보들…대법원 판결은 내게 수입금지 권리 부여”
-
7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8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9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0
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5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6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2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3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6
트럼프 폭주 “바보들…대법원 판결은 내게 수입금지 권리 부여”
-
7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8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9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0
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5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6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정운교수의 여가클리닉]혼자있는 주말에 슬픈 비디오 한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