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678>卷七.烏江의 슬픈 노래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7분
글자크기 설정

“팽성에서 원병이 왔구나. 내 차마 이리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는 얼른 수레에서 내려 말로 갈아탔다. 그때 한왕 등 뒤에서 커다란 구리종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유방은 달아나지 말라. 오늘은 네 목을 거두어 이 지저분한 싸움을 끝내리라.”
한왕이 돌아보니 중군을 갈라놓고 되돌아온 패왕 항우가 한왕을 보고 내지르는 소리였다.
패왕의 시뻘건 눈길에서는 그대로 불길이 뚝뚝 듣는 듯했다. 뱃심 좋고 느긋하기에는 한왕만 한 이도 드물었으나 그런 패왕의 눈길을 보자 흉내로라도 맞서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허리에 찬 보검을 빼어 들 겨를도 없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패왕이 그런 한왕을 곱게 놓아줄 리 없었다. 오추마를 박차 한왕의 뒤를 따르는데, 10만이 넘는 대군이 맞붙은 싸움터를 무인지경 가듯 하였다. 번쾌가 제때 돌아와 패왕을 가로막아 주지 않았으면 패왕의 창끝이 한왕을 꿰어 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군 가운데 으뜸가는 맹장 번쾌도 패왕의 적수는 못되었다. 큰칼로 여남은 번은 패왕의 창을 받아내었으나 이내 허둥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시무(柴武)가 어디선가 때맞추어 나타나 번쾌를 거들었다. 그러자 위태롭게 기울었던 싸움이 그럭저럭 볼 만해졌다.
한쪽으로 비켜선 한왕이 겨우 한숨을 돌리려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고함소리가 들렸다.
“누가 감히 우리 대왕께 덤비느냐?”
한왕이 보니 우람한 몸매를 갑옷투구로 가린 종리매가 한 마리 가라말(여구·驪駒·검은 말)을 휘몰아 달려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주발이 돌아와 종리매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한왕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아직 일렀다.
“서초의 대장 환초(桓楚)다. 유방은 어서 항복하지 못하겠느냐?”
또 한 갈래의 초군이 한군의 옆구리를 째고 중군 가운데로 뛰어들며 앞선 장수가 소리쳤다. 한왕의 군막을 지키던 젊은 도위(都尉)가 얼결에 달려 나가 맞섰으나 오래 버텨 낼 것 같지 않았다.
“아니 되겠습니다. 적이 대왕만을 노려 이 수레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수레를 몰고 있던 하후영이 한왕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낭중(郎中) 기병들을 불렀다.
“내가 이 수레를 몰고 나가 적장을 막아 보겠다. 너희들은 대왕을 모시고 후진으로 가라.”
그리고는 말고삐를 왼 팔목에 감더니 방패를 찾아 들고 긴 창을 빼들었다.
하후영이 바람처럼 수레를 몰아 환초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한왕이 멍하니 보고 있는데 낭중 기병들이 재촉했다.
“대왕. 이만 물러나시지요.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그제야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한왕이 뒤늦게 보검을 빼들며 허세를 부렸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오늘과 내일
구독
-

따만사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七. 烏江의 슬픈 노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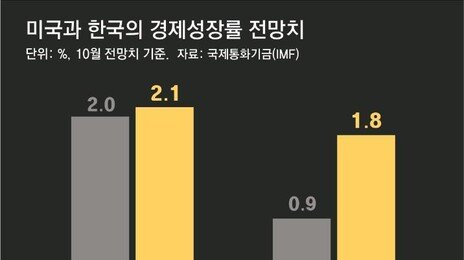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