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은 강도” 美 “대북제재 완화 불가”…비핵화 협상 급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8일 16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비핵화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한 미국을 ‘강도’에 비유해 비난을 쏟아내자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 것이다. 북-미 협상이 1차 위기를 맞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직후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신고, 검증 등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며 “이는 과거 미 행정부들이 고집하다 전쟁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정전 65주년인 이달 27일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기 전 “비핵화 시간표 등 모든 요소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는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은 발끈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일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을 가진 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ganster-like)’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당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 등 ‘북핵 스페셜리스트’를 모아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당분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미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은 물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북한이 외무성 담화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북-미가 정상외교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북미 비핵화 협상 >
구독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3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4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5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6
‘美에 메모리 공장’ 3대 난관…①인건비 2배에 이미 철수 경험
-
7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8
졸업 즉시 취업 10명에 1명뿐…“장백청, 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가”
-
9
원지안 “서늘한 칼날 같다, 도화지 같다…제게 여러 모습 있나봐요”
-
10
출근길 북극 한파…‘이 증상’ 보이면 지체말고 응급실로
-
1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4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5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6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7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8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
9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10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3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4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5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6
‘美에 메모리 공장’ 3대 난관…①인건비 2배에 이미 철수 경험
-
7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8
졸업 즉시 취업 10명에 1명뿐…“장백청, 日 잃어버린 세대 닮아가”
-
9
원지안 “서늘한 칼날 같다, 도화지 같다…제게 여러 모습 있나봐요”
-
10
출근길 북극 한파…‘이 증상’ 보이면 지체말고 응급실로
-
1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4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5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6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7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8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
9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10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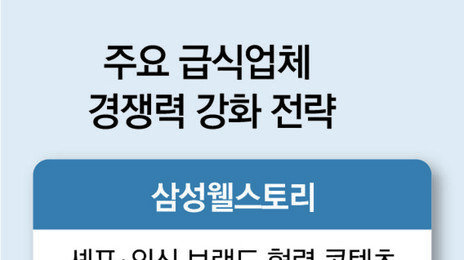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