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빨리빨리 개발’ 명암 보여준 故 김현옥 전 서울시장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인근 재개발을 두고 논쟁이 한창입니다.
6·25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비극을 지나온 뒤, 1960년대 서울은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성장과 욕망이 뒤엉킨 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판잣집과 무허가 주택은 산비탈까지 번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과 불도저식 정비, 시가지 직선화 등 ‘속도’ 중심의 도시 개조에 나섰습니다.
서울이 처음으로 ‘고도(高度)’라는 개념과 마주한 시기, 그 중심에 김현옥 서울시장(1926∼1997·사진)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김현옥은 군 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5·16군사정변에 가담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부산시장을 거쳐 40세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발탁되었습니다. 취임 당시 역대 두 번째로 젊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김현옥은 취임 다음 날부터 헬멧에 ‘돌격’이라 적고 현장을 누비며 대규모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곧 속도 중심의 개발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밤섬 주민 강제 이주, 고지대 아파트 강행 등 무리한 개발 정책이 이어졌고 결국 1970년 마포구 창전동 와우아파트 붕괴라는 참사로 귀결됐습니다.
33명이 숨진 이 사건은 불도저식 개발 방식이 가진 구조적 위험을 드러냈고, 김현옥은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세운상가는 현대식 입체도시를 표방한 초대형 복합단지였지만, 종묘 인근의 핵심 경관 축을 가로막아 도시 경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후로도 세운 4구역은 종묘와 청계천 사이 입지적 특징 때문에 문화유산 주변 경관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에 촉발된 종묘 인근 재개발 논쟁으로 우리는 ‘서울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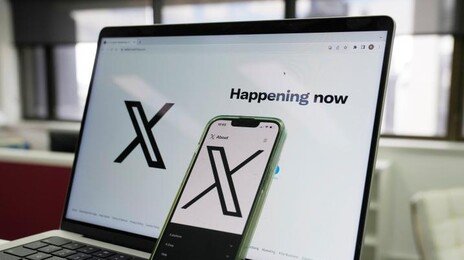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