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속 120km 나는 선수 보고 소름 쫙∼”
-
입력 2009년 9월 8일 02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스스로의 인생도 대표하지 못했던 오합지졸 국가대표팀이 흥행 점프에 성공했다. 스키점프 선수들의 좌충우돌 도전기를 그린 영화 ‘국가대표’는 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순위 11위에 올라섰다. 7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10일부터 일부 극장에서는 미공개 영상과 CG 장면을 15분가량 추가한 ‘국가대표 완결판-못 다한 이야기’를 상영한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38)과 대표팀 김흥수 코치(29)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배우들이 실제 대표팀과 합숙하며 만든 이 영화에서 김 감독이 선수와 배우들을 어르고 달래는 ‘맏형’이었다면, 김 코치는 배우들을 훈련시키고 감독을 돕는 조연출 역할을 해냈다.》
○ 김 감독, 태권도 선수 시절 떠올려 불신 씻어
“처음 봤을 때 꾀죄죄한 차림에 ‘이게 무슨 국가대표야’ 싶었어요. 영화감독이 자기네 얘기를 영화화하겠다는데 옆 테이블 여자나 뚫어져라 쳐다보고….(웃음)”(김 감독)
2년 전 서울 강남의 술집이었다. 제작사로부터 스키점프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자는 제의를 받았던 김 감독은 이 심드렁한 만남으로 오히려 더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나 대표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스키점프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영화사가 5년간 서너 곳. 한 영화사와 초상권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대표팀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비주류 종목으로 받는 설움도 모자라 영화까지 무산됐던 기분 아세요? 영화를 만든다는 데 대해 불신이랄까, 앙금이 많이 남아있었어요.”(김 코치)
서먹했던 양쪽이 마음을 돌린 계기는 운동이라는 공통분모였다. 김 감독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다.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며 그는 잊혀진 기억을 하나둘 떠올렸다.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경기장에만 들어서면 얼굴이 퍼렇게 질렸어요. 운동을 즐기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뒀어요. 그러니 배곯아 가며 운동하는 친구들이 위대해 보이지 않겠어요?”(김 감독)
진짜 같은 점프 장면을 만들고자 대표팀의 훈련과 경기가 열리는 전북 무주와 독일, 오스트리아를 오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키점프를 가까이서 본 무주에서의 첫날. “인간의 몸이 시속 120km 속도를 이겨내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소름이 확 끼쳤어요.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잠이 안 왔죠.”(김 감독)
그리고 2년간의 질긴 인연. 김 코치에게 김 감독은 이제 “대표팀 명예감독이자 여자 문제도 의논할 수 있는 형”이 됐다. 김 코치는 주인공 밥(하정우)의 대역을 자청해 2003년 그만뒀던 스키점프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 김 코치 “영화 한 편의 힘 얼마나 큰지 실감”
천군만마를 얻은 게 대표팀만은 아니다. 김 감독은 “욕도 안 먹고 흥행도 잘되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강박에 싸여 있던 나를 자유롭게 해준 사람들”이라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뭔지 배웠다”고 대표팀에 고마움을 표했다.
영화가 성공하자 실제 대표팀에도 기업들의 후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김 코치는 “영화 한 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나 들뜬 그를 보는 김 감독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분명히 너희들 형편, 지금보다 좋아질 거야. 그런데 오래는 안 갈 거야. 그저 지금처럼 멋지게 살자. 상처 안 받고 끝까지 살아남을 방법은 그것뿐인 것 같다.”(김 감독)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8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9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로… 윤영호, 권성동에 1억 하나엔 ‘王’자 노리개”
-
10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8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9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로… 윤영호, 권성동에 1억 하나엔 ‘王’자 노리개”
-
10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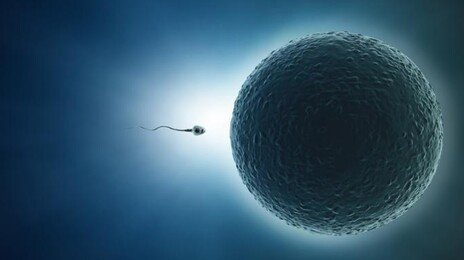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