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의 날씨]8월 3일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글자크기 설정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난 잡초를 보면서 생명의 끈질김에 경외감을 느낀다. 하지만 ‘하루 15시간을 나무에 매달려 잠자는 나무늘보 발톱 사이에는 이끼가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경외감이 아니라 헛웃음이 나온다. 무더위에 비까지 겹쳐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여름. 그래도 움직이자. 게으른 나무늘보 발에 자라는 이끼는 아름답지도, 신비하지도 않다.이완배 기자
오늘의 날씨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샌디에이고 특별전 맛보기
구독
-

김순덕 칼럼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2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3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4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5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6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7
일해도 노령연금 그대로, 이달부터 적용…지난해 감액분도 환급
-
8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9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10
李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옮기라면 옮기나”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9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10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트렌드뉴스
-
1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2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3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4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5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6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7
일해도 노령연금 그대로, 이달부터 적용…지난해 감액분도 환급
-
8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9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10
李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옮기라면 옮기나”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9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10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의 날씨]대체로 맑다가 곳곳 구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10/18/109749350.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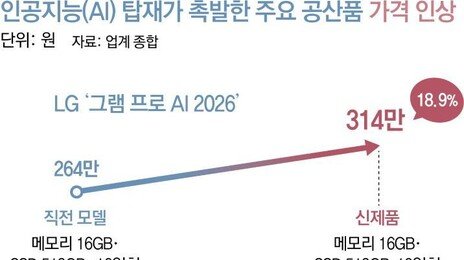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