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8월의 저편 221…몽달귀신(23)
-
입력 2003년 1월 19일 17시 32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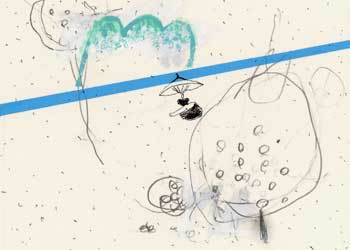
“그게 뭔데?”
“태반이다”
“태반이 뭔데?”
“형수 뱃속에 아가 있을 때 덮었던 이불이다. 너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반 위에서 잠자고, 탯줄로 맘마를 먹었다”
“탯줄은 또 뭔데?”
“엄마 배꼽하고 너 배꼽하고 이어져 있었던 줄이제.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어디에?”
“이 다음에 보여주꾸마”
“그 태반, 어쩔 건데?”
“강에다 떠내려보내야제. 건강하고 탈없이 잘 자라게 해 달라고 조상님한테 비는 거다. 자, 엄마하고 같이 강에 가자”
희향은 오른팔로 짚꾸러미를 옆에 껴안고 고무신에 발을 꿰었다.
“비가?”
“어데, 비 안 온다”
희향은 눈을 잔뜩 찌푸리고 손바닥을 위로 향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바닥에 물기가 느껴졌다. 비다. 체에 친 밀가루처럼 가늘디가는 비.
우근은 우산을 들고 강 쪽으로 걷기 시작한 희향을 종종 걸음으로 좇았다. 강가에 한 줄로 죽 늘어선 미루나무가 비 내리는 하늘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용두산 쪽으로 강가 길을 걷다가 아랑각 앞에서 둑을 내려갔다.
희향은 꾸러미를 강물에 던졌다. 풍덩, 소리내며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짚꾸러미에 멍석에 둘둘 말려 애장터에 묻힌 소원의 시신이 겹쳐졌다. 딸이 빠져 죽은 강에 첫 손자의 태반을 떠내려보내다니, 희향은 입술을 꼭 다물고 비내음이 나는 대기를 코로 들이마셨다. 그 숨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좀처럼 내뱉어지지 않았다.
유미리
8월의 저편 >
-

사설
구독
-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구독
-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구독
트렌드뉴스
-
1
성공하면 ‘돈벼락’…그리스 선박 10척, 위치정보 끄고 호르무즈 야밤 통과
-
2
강남 아파트보다 소박한 일론 머스크 집…수건은 한 장, 주방도 단촐
-
3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4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5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8
“비행기 타려면 좌석 두 개?”…美 항공사 정책 시끌
-
9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0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5
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
6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7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8
‘절윤’ 선언에도 국힘 지지율 20%… 張 취임후 최저
-
9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0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트렌드뉴스
-
1
성공하면 ‘돈벼락’…그리스 선박 10척, 위치정보 끄고 호르무즈 야밤 통과
-
2
강남 아파트보다 소박한 일론 머스크 집…수건은 한 장, 주방도 단촐
-
3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4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5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8
“비행기 타려면 좌석 두 개?”…美 항공사 정책 시끌
-
9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0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5
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
6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7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8
‘절윤’ 선언에도 국힘 지지율 20%… 張 취임후 최저
-
9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0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8월의 저편 222…몽달귀신(24)](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