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옛날 옛날에 오늘 오늘에
-
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36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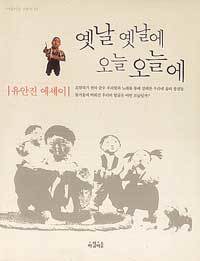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의 작가 유안진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의 새 수필집.
수록된 19편의 글은 맛깔스러운 옛 우리말과 노래에 얽힌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옛 우리말로 풀어 쓴 어린시절 추억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닥종이 인형사진이 중간 중간 들어있는 글 하나하나는 마치 빛바랜 낡은 흑백사진들을 보고 있는 듯 정겹다.
첫 번째 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카던데 월매나 고단할꼬’는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 같은 늦가을이었지, 아매(아마도) 두 소년이 서리 아침에 일찌감치 글방 훈장한테 글을 배우러 갔겠다. 그날따라 훈장은 두 소년에게 입때꺼지(이때껏)의 글공부의 효과를 시험하고 싶었던지, 갈(가을)이라는 시절 탓인지 시 한수를 짓게 했다.’(10쪽)
 |
따옴표 속의 인용구뿐만 아니라 따옴표 밖의 설명도 사투리가 간간히 섞인 흥미로운 글쓰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투리는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안동 사투리다.
대학 졸업 후 한때 교사로 일하던 작가가 고단해 못 일어나는 일요일이면 어머니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카는데, 월매나 고단할꼬오” 하며 측은해하셨다. 어린 것들을 가르치느라 하도 속을 태우다보니, 선생 똥은 개의 입맛에도 쓰디쓴 소태맛이었다던가.
작가는 ‘선생질’을 했던 자신과 ‘훈장질’을 했던 할아버지의 얘기를 ‘질’이란 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차시킨다.
‘질이라는 말은 원래는 전문직을 의미하는 좋은 뜻의 어휘였을 게다. 마치 계집이란 말이 조선조에는 그의 집이라는 좋은 의미였다가, 점차 비하하는 의미로 바뀐 것처럼. (중략) 훈장질은 훈장이란 글방선생이 자신과 동격인 어른, 즉 성인을 상대하지 않고 주로 코흘리개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란 점에서 여타 관직과 구별해 천시하는 의미를 담아낸 표현으로 본다. 훈장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등의 속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아동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군사부일체’ ‘선생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느니 ‘사부’ ‘사모’ 등의 표현으로 대우하려 애쓰기도 했던 것 같다.’ (21∼22쪽)
할아버지는 일고여덟살 먹은 손녀 딸 앞에서 두 소년이 지은 시에 대한 평을 늘어놓았다. 손녀는 그 이후에도 조부한테서 어떤 시론보다 더 위대한 간명한 시론을 자주 들었으나, ‘또 하시는’ 소리쯤으로 여겨 늘 귓등으로 넘겨듣곤 했다.
손녀가 시를 쓴다는 말을 전해들은 조부는 40여년간 손녀를 위해 시조를 비롯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나 ‘어리석은 손녀는 미국바람만 잔뜩 들어서 귀담아들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야 후회막급이다.
작가가 유학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집착해온 우리의 전통 육아와 민속의 연구 과정에서 얻은 수확물로 채워진 이 책은 작가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의 모습이 원형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얼마나 변해버렸는가를 비춰주는 돌거울’이 될 것이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스타일 >
-

동아광장
구독
-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구독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트렌드뉴스
-
1
모즈타바 첫 성명 “호르무즈 계속 봉쇄…피의 복수할것”
-
2
제니, ‘손가락 욕’ 사진 논란…사생팬-리셀러 겨냥?
-
3
[단독] 김경 “강선우가 돌려줬다는 5000만원, 내 돈 아냐”
-
4
[사설]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
-
5
국힘 당권파 부글부글 “오세훈에 목맬 필요있나…플랜B 있다”
-
6
테이저건 맞고도 꿈쩍않던 190㎝ 거구의 폭행범, 삼단봉으로 제압
-
7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8
[사설]吳는 또 등록 보이콧, 공관위는 또 어물쩍… 전대미문의 일
-
9
새 옷 입기 전 세탁해야 할까…피부과 전문의 권고는?[건강팩트체크]
-
10
캐나다 잠수함 사업서 獨 폭스바겐 발빼…韓 수주 가능성 커지나
-
1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
2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
3
‘사드’ 다음은… 美, 韓에 ‘전쟁 지원 요청’ 우려
-
4
‘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
5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
6
李 “신속히 민생 지원…직접 지원땐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
7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8
‘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
9
장동혁, ‘절윤’ 후속조치 일축… 오세훈, 공천 신청 안밝혀
-
10
[사설]檢개혁안 마구 흔드는 與 강경파… 누굴 믿고 이리 무도한가
트렌드뉴스
-
1
모즈타바 첫 성명 “호르무즈 계속 봉쇄…피의 복수할것”
-
2
제니, ‘손가락 욕’ 사진 논란…사생팬-리셀러 겨냥?
-
3
[단독] 김경 “강선우가 돌려줬다는 5000만원, 내 돈 아냐”
-
4
[사설]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
-
5
국힘 당권파 부글부글 “오세훈에 목맬 필요있나…플랜B 있다”
-
6
테이저건 맞고도 꿈쩍않던 190㎝ 거구의 폭행범, 삼단봉으로 제압
-
7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8
[사설]吳는 또 등록 보이콧, 공관위는 또 어물쩍… 전대미문의 일
-
9
새 옷 입기 전 세탁해야 할까…피부과 전문의 권고는?[건강팩트체크]
-
10
캐나다 잠수함 사업서 獨 폭스바겐 발빼…韓 수주 가능성 커지나
-
1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
2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
3
‘사드’ 다음은… 美, 韓에 ‘전쟁 지원 요청’ 우려
-
4
‘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
5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
6
李 “신속히 민생 지원…직접 지원땐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
7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8
‘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
9
장동혁, ‘절윤’ 후속조치 일축… 오세훈, 공천 신청 안밝혀
-
10
[사설]檢개혁안 마구 흔드는 與 강경파… 누굴 믿고 이리 무도한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