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포츠용품 밑뿌리 된 것에 보람”…반세기 역사 문 닫는 ‘Y스포츠상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8일 17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반세기 한국 스포츠의 추억이 어린 스포츠용품사 한 곳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 종로구 서울 YMCA 건물 지하 1층 ‘Y스포츠상사’. 5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던 1세대 스포츠용품사인데 이번 달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1971년 개업한 Y스포츠상사는 변변한 국산 스포츠 용품이 없던 시절 자체 제작하거나 다양한 수입선을 통해 확보한 용품을 선수와 일반인에게 용품을 보급해왔다. 매장에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제작한 펜싱 칼과 마스크, 장갑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용품들이 전시돼 있다. 매장 안에는 현재 팔고 있는 물건과 함께 오래된 옛 용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 스포츠 종목별 유니폼과 각종 국제대회 팜플렛, 펜던트 등 희귀한 역사 자료들도 숱하다. 공간은 크지 않지만 제법 스포츠 역사박물관 티가 난다.
창업자인 조성무(80) 대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해 온 것. 가뭄에 콩나듯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조 대표는 예전 용품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으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낸다. 40여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리듬체조 곤봉부터 닳고 닳은 축구화, 역도화, 권투화, 그리고 유도복…. 조 대표는 “월급 6500원을 주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는데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고 웃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스포츠 용품들을 온라인 등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몇 년 전만 해도 단체 유니폼 주문 정도는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갈수록 손님 발길이 끊겼다. 가끔씩 YMCA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사람들이 수영복이나 물안경 등을 사러 오는 정도다. 이 업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옛 용품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는 조 대표는 “온전한 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게 아쉽지만 한국 스포츠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1967년 YMCA에 입사해 체육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선수나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더 좋은 장비와 용품을 공급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장을 열었다. 그 후 조 대표가 직접 주문해 만들어 보지 않은 스포츠 용품이 없다.
한국 스포츠가 막 뻗어나가려는 시절 종목별 심판복까지 제작했을 정도다. 선수들도 제 때 용품을 공급받기 쉽지 않았던 1970, 80년대에는 수입 용품을 어렵게 구해 이리저리 연구한 끝에 용품을 제작해 선수들에게 써보게 하기도 했다. 도저히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중도 포기한 적도 많았다.
1970년대 초반 만들었던 선수용 스판 수영복 1호는 그의 대표작이다. 일본 업체들과 제작 협력 계약이 잘 안 돼 홀로 전국의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품질이 괜찮은 스판 소재를 찾았다. 나중에는 수영복 원단으로 보디빌딩 선수들의 팬츠를 제작했다. 스포츠용품사 사장이었지만 판매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스포츠용품 국산화를 위해 무수히 발품을 팔았다.
펜싱의 경우 수입 제품을 모두 분석해 최초로 국산 펜싱 마스크와 관련 용품을 만들었다. 수입산에만 의존했던 배드민턴 라켓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적인 라켓 브랜드가 있는 대만 전역을 돌아보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조 대표는 “당시 스포츠계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예상치 못한 종목에서 국산 용품 브랜드가 생겨났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외국 스포츠용품 분석에는 도가 텄다. 심지어 김포공항 세관원들이 수입 용품들이 들어올 때 전화를 걸어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다고 한다.
과거 운동선수들에게 Y스포츠상사의 존재는 특별했다. 그들이 용품 조달에 애를 먹으면 조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 대표는 “1970년대는 농구공이 무척 귀했다. 미군 부대에서 쓰다 나온 공을 이리저리 부탁해 얻어 실업, 은행팀에 2, 3개씩 주곤 했다”고 회상했다. 농구는 특히 애정이 많다.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이 친척 여동생의 남편이다. 한 때 농구공 국산 제작도 시도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다.
조 대표는 “막상 매장을 접을 결심을 하니 마치 몸 일부분이 찢겨져 나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40~50년 전만 해도 ‘국산 용품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걸 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한국 스포츠 용품 역사의 밑뿌리가 된 것은 보람이고 내 자랑이지만 후계자를 정하는 타이밍을 놓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매장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집과 저만의 공간에서 추억을 계속 간직할 생각입니다.”
1971년 개업한 Y스포츠상사는 변변한 국산 스포츠 용품이 없던 시절 자체 제작하거나 다양한 수입선을 통해 확보한 용품을 선수와 일반인에게 용품을 보급해왔다. 매장에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제작한 펜싱 칼과 마스크, 장갑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용품들이 전시돼 있다. 매장 안에는 현재 팔고 있는 물건과 함께 오래된 옛 용품들이 빼곡히 쌓여 있다. 스포츠 종목별 유니폼과 각종 국제대회 팜플렛, 펜던트 등 희귀한 역사 자료들도 숱하다. 공간은 크지 않지만 제법 스포츠 역사박물관 티가 난다.
창업자인 조성무(80) 대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해 온 것. 가뭄에 콩나듯 손님이라도 찾아오면 조 대표는 예전 용품들을 하나둘씩 꺼내놓으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낸다. 40여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든 리듬체조 곤봉부터 닳고 닳은 축구화, 역도화, 권투화, 그리고 유도복…. 조 대표는 “월급 6500원을 주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는데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고 웃었다.
1967년 YMCA에 입사해 체육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선수나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들에게 더 좋은 장비와 용품을 공급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장을 열었다. 그 후 조 대표가 직접 주문해 만들어 보지 않은 스포츠 용품이 없다.
한국 스포츠가 막 뻗어나가려는 시절 종목별 심판복까지 제작했을 정도다. 선수들도 제 때 용품을 공급받기 쉽지 않았던 1970, 80년대에는 수입 용품을 어렵게 구해 이리저리 연구한 끝에 용품을 제작해 선수들에게 써보게 하기도 했다. 도저히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중도 포기한 적도 많았다.
1970년대 초반 만들었던 선수용 스판 수영복 1호는 그의 대표작이다. 일본 업체들과 제작 협력 계약이 잘 안 돼 홀로 전국의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품질이 괜찮은 스판 소재를 찾았다. 나중에는 수영복 원단으로 보디빌딩 선수들의 팬츠를 제작했다. 스포츠용품사 사장이었지만 판매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스포츠용품 국산화를 위해 무수히 발품을 팔았다.
과거 운동선수들에게 Y스포츠상사의 존재는 특별했다. 그들이 용품 조달에 애를 먹으면 조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 대표는 “1970년대는 농구공이 무척 귀했다. 미군 부대에서 쓰다 나온 공을 이리저리 부탁해 얻어 실업, 은행팀에 2, 3개씩 주곤 했다”고 회상했다. 농구는 특히 애정이 많다.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이 친척 여동생의 남편이다. 한 때 농구공 국산 제작도 시도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다.
조 대표는 “막상 매장을 접을 결심을 하니 마치 몸 일부분이 찢겨져 나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40~50년 전만 해도 ‘국산 용품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걸 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한국 스포츠 용품 역사의 밑뿌리가 된 것은 보람이고 내 자랑이지만 후계자를 정하는 타이밍을 놓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매장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집과 저만의 공간에서 추억을 계속 간직할 생각입니다.”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3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4
北 열병식에 김주애 등장…김정은과 같은 가죽외투 입어
-
5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6
한국인 3명 중 1명 아침 굶는데… ‘뼈 건강’엔 빨간불[노화설계]
-
7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8
BTS 정국, 심야에 취중 라방…“답답하고 짜증나” 불만 쏟아내
-
9
해킹 강타한 멕시코…납세자·유권자·공무원 자료 다 털렸다
-
10
“유관순 방귀로켓” “523호 출발”…선넘은 ‘고인 모독’ AI 영상에 공분
-
1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2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6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9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10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등록-국힘은 13명 그쳐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3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4
北 열병식에 김주애 등장…김정은과 같은 가죽외투 입어
-
5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6
한국인 3명 중 1명 아침 굶는데… ‘뼈 건강’엔 빨간불[노화설계]
-
7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8
BTS 정국, 심야에 취중 라방…“답답하고 짜증나” 불만 쏟아내
-
9
해킹 강타한 멕시코…납세자·유권자·공무원 자료 다 털렸다
-
10
“유관순 방귀로켓” “523호 출발”…선넘은 ‘고인 모독’ AI 영상에 공분
-
1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2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3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4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5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6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9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10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등록-국힘은 13명 그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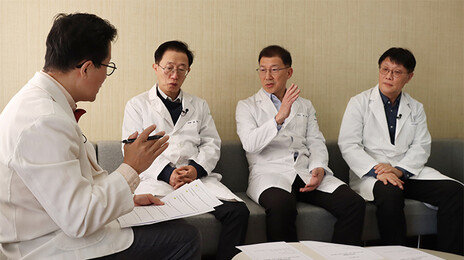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