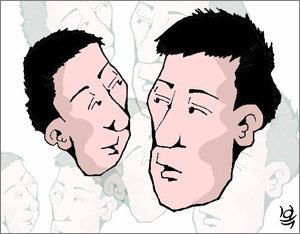
유전공학의 기초 원리 및 역사와 최근 성과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 책으로, 황우석 박사가 번역한 ‘어떻게 양을 복제할까’(헤이즐 리처드슨·사이언스북스·1999년)가 있다.
다윈의 진화론, 멘델의 유전법칙 발견, DNA 구조 발견 노력 등 유전공학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1996년 세계 최초로 탄생한 복제양 돌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명복제의 원리와 방법을 소개한다.
생명복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복제의 가능성과 그 윤리적 문제에 관한 우려와 논란도 커진다. 불치병에 걸린 피아니스트 이리스는 자신의 예술적 삶을 연장할 목적으로 복제인간 시리를 만들었다. 이리스와 시리는 모녀지간이자 쌍둥이 자매가 되는 셈이다. 시리는 자신이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자의식, 원본이 아니라 블루 프린트(청사진)라는 자기정체성의 고민에 시달린다.
다행히 현실의 얘기가 아니라 샤를로테 케르너의 소설 ‘블루 프린트’(다른우리·2002년)의 내용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인간 복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복제인간의 정체성 문제와 우리가 자신의 복제인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다분히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다.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미래 사회상을 전망한 책으로 제러미 리프킨의 ‘바이오테크 시대’(민음사·1999년)가 있다.
소수의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유전자 특허를 소유하고 지구생물권이 유전자 오염에 시달리며 유전자형에 따른 계급사회가 출현한다는 전망은 재앙으로 다가오지만, 유전병과 불치병 치료, 병충해에 강한 농작물 개발, 자신의 체세포로 장기를 복제해 부작용 없이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기술 등 생명공학의 순기능은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상업적 목적이 생명공학과 결탁하는 데 있다. 우리가 생명공학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표정훈 출판평론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구독-

공기업 감동경영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 인문학 소멸위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기록적 엔저, 미국에 대재앙”… 재집권땐 ‘제2플라자 합의’ 추진 시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이어 민주당 서울 당선인들 만나는 오세훈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車에 관한 모든것](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