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美정권 파워엘리트]법률가→학자→기업인으로 권력 이동
-
입력 2007년 2월 10일 02시 54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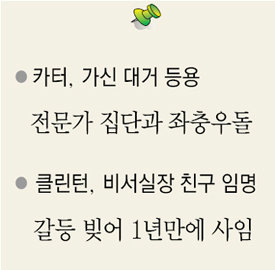
미국에서 핵심 요직의 중요한 인재풀은 역시 법률가와 학자, 정치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에 추가해 기업 최고경영인(CEO)이 핵심 인재풀로 부각되는 추세다.
분석 대상 41명 가운데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가 9명이었다.
문민통제가 확립된 탓에 직업 군인 출신은 거의 없다. 국방장관 가운데도 정통 직업 군인 출신은 1명도 없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월(조지 W 부시 행정부), 알렉산더 헤이그(레이건 행정부) 장관만이 직업 군인 출신이었다. 직업외교관 출신 장관은 단 2명에 그쳤다.
정권 간의 극명한 대조는 최우등생의 상징인 로즈 장학생 출신이 이끈 클린턴 행정부와 석유사업가 출신이자 첫 경영학석사(MBA) 출신 대통령인 현 부시 대통령의 인사에서 나타난다.
클린턴 행정부에선 대통령의 영국 유학 동기인 로버트 라이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로즈 장학생 출신이 특히 많았다. 제임스 울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강경파인 네오콘으로 분류되지만 로즈 장학생 출신이어서 민주당 정부인데도 기용됐다.
반면 예일대를 거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친기업적 정책관은 최고경영자(CEO)의 조직 경험을 중요시하는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포천 500대 기업 CEO 출신만 10명에 가깝다.
딕 체니(군수 및 석유기업인 핼리버튼 회장)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제약회사 설, 정보기술기업 제너럴 인스트루먼트 회장) 국방장관, 헨리 폴슨(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회장) 재무장관, 칼로스 구티에레즈(식품회사 켈로그 회장) 상무장관, 폴 오닐(알루미늄기업 알코아 회장) 재무장관, 존 스노(철도회사 CSX 회장) 재무장관, 앤드루 카드(미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비서실장 등이 모두 CEO 경험을 갖고 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MBA를 거쳤다.
장관은 대통령의 4년 임기를 같이한다는 관행이 정착된 미국에서도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는 업무량 폭주에 따른 피로누적 때문에 지난 26년간 평균 재임기간이 2.0년으로 가장 짧았다. 반면 교육부 장관 자리는 26년간 7명이 평균 4년 가까이 재임했다.
역대 정권들 모두 법률가 학자 경영인 등이 주요 인재그룹으로 역할을 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법률가→학자→기업경영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추세다. 그 같은 흐름 속에서도 공통된 요소를 찾는다면 등용된 사람들 대부분이 큰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경력자들이라는 점이다.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로 42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박윤식(워싱턴한인포럼 공동대표)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여러 정권들을 관통하는 인재 등용의 핵심 요소로 △어떤 분야이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을 통해 검증된 관리 능력 △국제 감각 △이른바 엘리트 대학 출신 등의 세 가지를 꼽았다.
장관 및 실장급 아래의 요직 충원도 대부분 능력이 검증된 인재풀에서 이뤄진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분야별로 민주, 공화당별로 전문가 그룹이 형성돼 있어 다음에 어느 당이 집권할 경우 누구누구가 행정부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느 정치인에게 줄을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진보 이념에 따른 각각의 전문가 그룹 내에서 능력 있는 일원으로만 인정받으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대통령은 NO할 수 있는 참모 뽑아야”
대통령학 연구가 데이비스 교수
데이비스 교수는 “가장 자주 대면하고 의견을 나누는 비서실장에 최고의 인물을 골라 가장 먼저 모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악관 참모, 장관 순서로 사람을 뽑아도 무방하다는 것.
그는 특히 “‘고무도장’을 원치 않는다면 대통령은 참모 구성 때 손발을 잘 맞추면서도 반론을 낼 배짱 있는 보좌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대통령이 ‘충성심을 우선시해 장관을 뽑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미국의 장관은 한국처럼 ‘minister’가 아니라 비서라는 의미의 ‘secretary’다.
미국 공직사회의 특징은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로 이어지는 고위직이 사실상 모두 정무직이라는 것. 전문성을 갖고 시작한 엘리트 직업관료에게도 ‘부차관보’ 정도가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한 최고위직이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런 제도에 단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직이 충성도 중심으로 채워지면 무능함을 메울 방법이 없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 대응과 이라크 정책의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백악관엔 코드 드물다
특히 ‘워싱턴 이너서클’ 경험 없이 지방에서 주지사를 거쳐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엔 ‘아웃사이더 그룹’을 데리고 들어오게 마련. 이때 이들을 어떤 자리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지워싱턴대 박윤식 교수는 “미국에서 장관직은 물론이고 백악관에서도 (일정을 짜는 등의 수행비서 역할이 아닌) 정책을 움직이는 자리에 가신(家臣)이나 코드만 갖고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단 그 같은 실패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지사 출신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밀턴 조든 비서실장과 조지 파월 대변인을 비롯한 가신을 백악관에 대거 등용하는 바람에 조지아 지역 신문들이 공수돼 백악관 주변 신문 가판대에서 팔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 아웃사이더는 워싱턴의 생리를 잘 모른 채 전문가 집단과 좌충우돌했다.
농촌 지역인 아칸소 주의 소도시에서 태어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죽마고우이자 동급생인 맥 매클라티를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경영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워싱턴 정치 문화를 너무 몰랐던 그는 주변과의 갈등 끝에 1년 만에 사임해야 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텍사스 출신의 로펌 경영자로 워싱턴에 인맥이 많은 제임스 베이커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수양아들’처럼 따라다니던 마이클 디버 씨를 부실장으로 임명해 조화를 도모했다.
베이커 씨는 비서실장에 이어 재무장관을 지내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무장관, 비서실장으로 계속 등용됐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부시 전 대통령과 베이커 씨는 텍사스 주 휴스턴을 거점으로 30년간 우정을 맺은 사이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