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구름모자 벗기게임 (42)
-
입력 1998년 9월 4일 19시 29분
글자크기 설정

두 아이는 차 뒷문에 조롱조롱 붙어 힘들게 문을 열고는 탔다. 이미 둘 다 흠뻑 젖은 상태였다.
―우리 아빠는 굉장히 큰 차 있어요.
아이가 차를 얻어 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지 중얼거렸다.
―무슨 찬데 그렇게 커?
수가 재빨리 물었다.
―응 트레일러야. 그건 아파트만큼 비싸.
―와…. 느네 아빠 대단하다!
수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수는 트레일러나 레미콘 트럭이나 불도저, 포크레인과 그것을 모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찬탄을 금치 못했다.
휴게소 뒷길에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휴게소는 더욱 낡고 남루해 보이고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같았다. 비치 파라솔과 함부로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과 공중전화 부스와 무궁화꽃이 핀 울타리와 짙푸른 잔디밭에 흙물이 괴여 있었다. 철구조물 위를 뒤덮은 초록 넝쿨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고개를 빳빳하게 세운 뱀처럼 꿈틀꿈틀 거리며 순간 순간 뻗어 나오고 있었다.
차를 휴게소 집 앞에 바짝 댔다. 휴게소집 딸아이는 차에서 내려 손바닥을 흔들더니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차창을 내렸다. 빗방울이 얼굴에 부딪쳤다.
―엄마… 엄마… 엄마…
아이는 연이어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점점 아기같고 절박해졌다. 불길하게 느껴지는 외침이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수가 차에서 내려서더니 우산을 들고 물이 고인 잔디밭으로 들어가 장화발로 첨벙 첨벙 돌아다녔다. 나도 차에서 내려 차문을 탕 닫았다. 그 순간 휴게소 집 안에서 살을 찢는 듯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딸아이가 재빨리 나를 돌아보았다. 두 눈에 놀람이나 공포가 아닌 자신의 출생만큼이나 오래된 비애가 어려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비명 소리가 난 뒤 잠시 적막감이 흐르다가 여자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남자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문 열어 젖히는 소리와 가게 바닥에 술병 같은 것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비명소리…….
나는 힘센 남자처럼 주먹을 꽉 쥐고 휴게소 문을 탕탕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봐요… 이봐요…
휴게소 안에서 두 몸이 부딪치고 엉기고 소리지르는 것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문을 확 열어젖히고 여자가 튀어나왔다.
여자는 치마 하나를 손에 쥐었을 뿐 놀랍게도 맨 몸이었다.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여자는 나를 보지도 않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다리를 활짝 벌리고 짐승처럼 힘차게 달렸다. 여자는 이제 막 8톤 트럭 한 대가 지나간 국도로 곧장 달려나갔다.
조금 사이를 두고 뒤따라 나온 남자가 이제 막 바지를 끼워 입었는지 위에는 맨몸인 채 바지춤을 쥐고 비틀거리며 여자를 따라 달렸다. 한 손에 깨어진 맥주병의 주둥이를 꽉 쥐고 있었다. 검붉은 살갗에 물에 불은 듯 커다란 체구의 남자였다.
나는 수와 딸아이를 와락 잡아끌어 차에 태우고 여자가 달려나간 국도 쪽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 여자와 남자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은 해마떼의 등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미끄럽고 탄력있어 보였다. 국도변의 가로수인 한국 목련이 비에 젖은 커다란 잎을 평화롭게 너울거렸다.
전경린 글·엄택수 그림
총선 : 시민단체 >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K-TECH 글로벌 리더스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3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4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5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6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7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8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9
”尹 무기징역 형량 가볍다“ 42%…“적절하다” 26%
-
10
“강아지 뒤 배경 지워줘”에…5초만에 깔끔 사진 변신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트렌드뉴스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치통에 현금 2억, 안방엔 금두꺼비…고액체납자 은닉 재산 81억 압류
-
3
홍준표 “법왜곡죄, 박정희 국가원수 모독죄 신설과 다를 바 없어”
-
4
“야 임마” “與, 또 뒤통수”…국힘 몫 방미통위 추천안 부결 충돌
-
5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6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7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홍라희와 함박웃음
-
8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9
”尹 무기징역 형량 가볍다“ 42%…“적절하다” 26%
-
10
“강아지 뒤 배경 지워줘”에…5초만에 깔끔 사진 변신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4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5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6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7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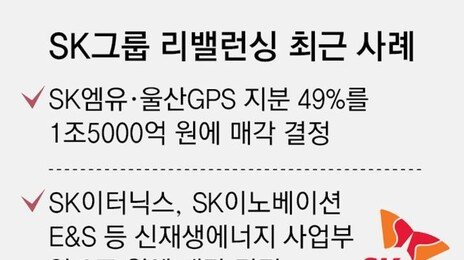
![[사설]韓엔 “영원한 적” 美엔 대화 손짓… 김정은의 ‘통미봉남’ 이간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33173.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