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김영식]특명전권대사의 정신이 필요하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정보 홍수 시대엔 외교관들의 설 땅이 좁아진다.
과거 특명전권대사라는 타이틀로 해외에 파견된 재외공관 수장들은 국가의 원수를 대신하는 국가대표였다. 특명은 지도자의 뜻을 받는다는 것이고, 전권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고 그 책임도 진다는 의미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본국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 얘기다.
이젠 환경이 달라졌다.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을 거친 현 시점에선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외교 사안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이처럼 정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시대에선 특명전권대사의 역할은 축소되고 정보가 모이는 외교부 본부의 힘과 목소리가 커지는 법이다.
2012년 8월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을 겨냥한 사과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던 시점의 얘기다.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아쉬움의 표현이었지만 지금도 상황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신안보동맹 체제를 구축하자 한국 외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작금의 동북아 국제질서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국제질서를 이끌겠다는 신형대국관계를 앞세워 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세우는 미국의 대응 카드는 일본과의 동맹 강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영역에선 하나의 행동이 대응을 낳고, 새로운 동맹은 이에 대응하는 동맹을 불러온다. 강력한 미일 신안보동맹은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동맹 또는 공동대응 전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관계의 이합집산 속에서 어느 일방과의 관계만 중시해선 설 땅을 찾지 못하는 외교의 ‘21세기 춘추전국시대’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한국 외교 ‘신(新)실용의 길’ 시리즈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외교를 걱정하는 여론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문제없다”는 답변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가 어려움에 빠진 주요 이유는 이런 외교 전략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젊은 외교관이라면 어학에 능통하고 국제경제나 안보 문제를 잘 알면 된다. 하지만 고위급 외교관이라면 전략가여야 한다. 깊은 성찰과 필요할 때 싸울 수 있는 투지,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야 외교가 살아난다. 하지만 아무런 투지를 보이지 않는 선배들을 보면서 젊은 후배 외교관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전략도 없고, 특명전권대사의 책임감도 없다면 본부에서 지시하는 성격의 전문만 쏟아낸다고 안 되던 외교가 갑자기 잘될 리 없다.
김영식 정치부 차장 spear@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4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5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6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9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10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4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5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6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9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10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임현석]시진핑 실각설이 남긴 진짜 질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01/13327654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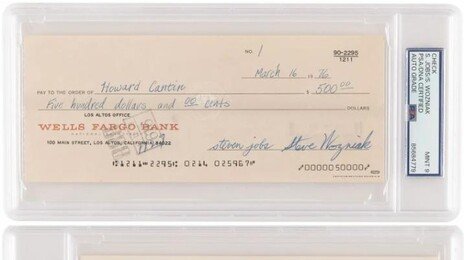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