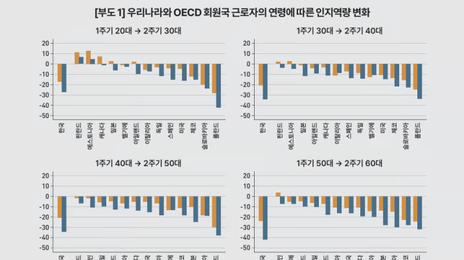공유하기
[베이스볼 브레이크] 고요한 FA 시장 만든 3가지 요소
- 스포츠동아
글자크기 설정

FA(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잠잠하다. 개장과 함께 맞이한 주말이 조용히 지나갔다. 우선협상기간 폐지라는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무엇이 시장을 고요하게 만들었을까.
● 해외진출 노리는 대어들, 시장은 경직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유독 많은 ‘FA 대어’들에 있다. 15명의 FA 신청자 중 무려 5명이 ‘해외진출’을 함께 고려 중이다. 좌완 에이스 3총사, 김광현 양현종 차우찬에 외야수 최형우, 내야수 황재균까지 큰 무대를 꿈꾸고 있다.
대어급들의 행선지가 결정돼야 나머지 선수들도 갈 곳을 찾는 역대 FA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히려 대어가 많아 시장이 경직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 100억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최대어의 국내 잔류엔 한 가지 꼬리표가 붙는다. FA 18년 역사상 최초로 ‘100억원’ 선수가 탄생할지 여부다. ‘최고대우’라는 결론 아래 교감을 나누고 있지만, 이 액수에 대해선 구단도 고민이 많다. 해당 선수들과 연관된 팀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하나”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외국인선수를 1명 더 늘린 것이나 육성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것 모두 FA 거품을 빼자면서 나온 대책들이다. 이제 외국인선수는 3명 모두 100만달러짜리 특급을 원하고, FA까지 100억원 얘기가 나온다. 결국 돈은 돈대로 더 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 최순실 게이트, FA 시장까지 불똥?
불안한 시국 역시 FA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국내 사정이 모기업의 우산 아래 운영되는 프로구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았다.
시장에서 돈을 푸는 건 보통 대기업 구단들이다. 여기에 대기업 구단 외에 잠재적 소비자인 NC 같은 구단은 승부조작 등 스캔들 연루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누가 먼저 지갑을 열지, ‘1호 계약’을 두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트렌드뉴스
-
1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2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3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4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5
백해룡, 이번엔 李대통령 겨냥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
-
6
조정석·거미 부부 6년만에 둘째딸 출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
7
서울 버스파업 이틀째 노사 팽팽…“필수인력 유지 법제화” 목소리
-
8
美, 마두로 체포때 러 방공시스템 ‘먹통’…창고에 방치돼 있었다
-
9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10
‘119년 전통’ 광주 중앙초교, 올해 신입생 0명 충격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3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트렌드뉴스
-
1
‘뱃살 쏘옥’ 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방법?
-
2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3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4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5
백해룡, 이번엔 李대통령 겨냥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
-
6
조정석·거미 부부 6년만에 둘째딸 출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
7
서울 버스파업 이틀째 노사 팽팽…“필수인력 유지 법제화” 목소리
-
8
美, 마두로 체포때 러 방공시스템 ‘먹통’…창고에 방치돼 있었다
-
9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10
‘119년 전통’ 광주 중앙초교, 올해 신입생 0명 충격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3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