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문가기고]‘온 마을’ 만들기에 모두가 나서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마을이 학교다’라는 교육정책 슬로건을 앞장서서 내걸었던 한 지역의 어색한 풍경이 생각난다.
지역정책 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마을이 학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질문 이유는 마을의 풍경이 사라진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마을이 학교다’라는 구호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누구 말처럼 마을이라기보다는 그저 주소지가 거기에 있었을 뿐이기 때문이리라. 이제는 제법 ‘마을 교육’을 표방한 사업들이 많아져 ‘마을 교사’라는 말도 꽤 익숙해졌다. 익숙해진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을은 많이 복원됐을 것이다.
마을 교육이 익숙해지고 마을 자원이 학교와 협업하는 일이 흔해지고 난 뒤 일어난, 얼마 전 일이다. 마을 교육에 대해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 곁에 있던 한 주민이 ‘근데 마을이 뭐예요’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한참을 마을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 터라 너무나도 엉뚱하게 들렸던 이 질문은 오히려 마을 교육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알게 했다.
온 마을을 만들려면 온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부처 간 칸막이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부처들이 각기 다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사후에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돌봄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던 것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원인이 있다. 게다가 낮은 출생률로 연계의 욕구보다는 경쟁의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
교육부 주축의 늘봄사업이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기관들은 서비스 중단이라는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비스들이 연계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교육부의 늘봄사업 연계가 대표적이다.
전혀 이질적인 사업 간의 협력 사례도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마을사업과 마을 교육사업이 연계된 좋은 사례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에 교육적인 마인드가 개입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청소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도시’ 사업은 마을의 복원에 활력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도시재생과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과정을 연계한 마을과 학교 간의 협력 사례들도 늘고 있다.
마을사업의 동력, 주민자치
칸막이를 넘나드는 데 주저함이 없는 교사와 공무원, 지역의 전문가들 덕분에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마을 교육 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들 덕분이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기관장, 지역 담당자가 바뀌면 그간의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일까. 하지만 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경우는 다르다.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협력의 성과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강한 기대감과 지역 네트워크가 쌓아온 업적에 달려 있다. 기대와 네트워크가 이뤄낸 성과가 주민자치의 동력이다. 이런 성과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오랫동안 일궈낸 성과가 단숨에 증발해버리는 일도 많다. 지자체장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소신이 다를지라도 주민자치의 원리를 통한 마을의 복원력만큼은 반드시 담보해줘야 한다. 지자체와 마을 그리고 마을의 교육은 주민의 것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의 복원은 총력전이어야
마을이 지속 가능한 동력을 갖고 마을 교육이 제대로 안착이 되더라도 인구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조류를 이겨내는 일은 전쟁과도 같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구호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마을’에서도 주민들은 “그래도 결국은 아이들은 떠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마을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도 한다.
마을을 세우는 일보다 마을이 무너져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지방 의대도 못 가서 난리지만 지방병원에는 보낼 의사가 없는 아이러니도 결국은 마을이 무너져가는 현상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을은 더 큰 시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막 시작한 글로컬 대학도 온 마을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메가시티 구상은 온 마을 만들기의 또 다른 버전이다.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알쓸톡
구독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트렌디깅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5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6
“더 울어봐야 한다”…이동국 아들, 아빠의 ‘독한 말’에도 끄덕끄덕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10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① 美공장 고비용에 인력난… TSMC도 숙련공 대만서 데려가
-
7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
10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5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6
“더 울어봐야 한다”…이동국 아들, 아빠의 ‘독한 말’에도 끄덕끄덕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10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① 美공장 고비용에 인력난… TSMC도 숙련공 대만서 데려가
-
7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
10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절개 없는 전립선비대증 치료 ‘유로리프트’, 일상 복귀 빠른 신개념 시술로 주목[기고/이무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6/1331707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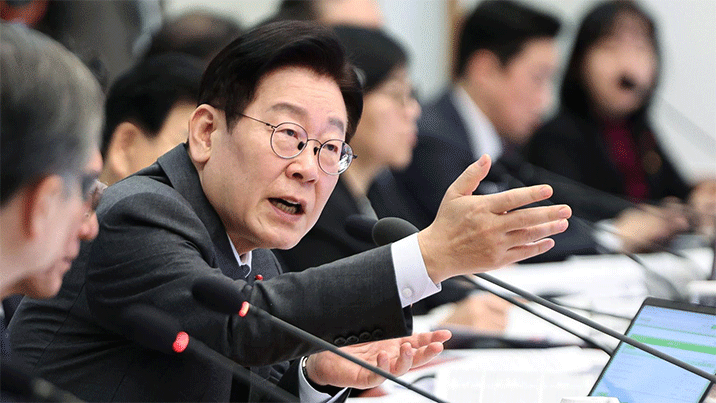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