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이승건]스포츠인 2세… 피는 못 속인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3월에 시작한 2017 대학농구리그가 지난주 ‘영원한 맞수’ 고려대-연세대의 챔피언결정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승리 팀은 주장 허훈(22)이 맹활약한 연세대였다.
1, 2차전 평균 16.5점으로 양 팀 최다 점수를 올린 그는 이견 없이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리그 2연패에 성공한 연세대가 기쁨을 만끽할 때 이를 지켜보며 내년을 다짐한 선수가 있었다. 평균 15.0점으로 팀 최다 득점을 기록한 고려대 김진영(19)이다.
허훈은 설명이 필요 없는 ‘농구 대통령’ 허재 국가대표 감독(52)의 둘째 아들이다. 허 감독의 큰아들 허웅(24)도 농구를 한다. 프로농구 동부 소속으로 지금은 군 팀 상무에서 뛰고 있는데 최근 두 시즌 연속 올스타전 팬 투표 1위를 할 정도로 기량이 좋고 인기도 높다.
두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챔피언결정전 1차전이 열린 고려대 화정체육관을 직접 찾았다. 대학농구 최고의 무대에서 펼쳐진 2세들의 대결을 ‘한국 농구의 레전드’ 두 아버지가 지켜보는 장면을 보며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절로 떠올랐다.
농구는 대를 이은 사례가 유독 많다. 한국농구연맹 김영기 총재, 한국여자농구연맹 양원준 사무총장 등 선수 출신 행정가는 물론 프로농구 챔피언 KGC의 김승기 감독 등 현역 지도자 가운데도 농구 집안이 수두룩하다. 어릴 때부터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이 이유겠지만 체격 조건이 중요한 종목 특성상 2세들이 이런 면에서 일단 유리한 것도 그 배경이다.
아버지처럼 굵은 팔뚝과 넓은 어깨를 지닌 허훈은 저돌적으로 골밑을 파고들었다. 아버지처럼 크고 마른 체격의 김진영은 영리하게 몸싸움을 했다. 김 전 감독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키 198cm에 몸무게 69kg이었다. 진영이는 지금 193cm에 63kg이다. 잘 먹고 웨이트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 나도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어쩔 수 없나 보다”라며 웃었다. 플레이만 봐도 누구 아들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전자의 힘은 강력했다. 어디 농구뿐이랴. 올해 신인왕을 예약한 야구 이정후-이종범, 축구 차두리-차범근 부자(父子)도 스포츠 유전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례들이다.
이승건 스포츠부 차장 why@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구독
-

알쓸톡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5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6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7
머리카락보다 먼저 늙는 두피… 방치하면 ‘듬성듬성 모발’ 된다
-
8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9
‘연쇄살인’ 20대女에 당한 남자 또 나와…노래주점서 실신
-
10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2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브런슨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
8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9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0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5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6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7
머리카락보다 먼저 늙는 두피… 방치하면 ‘듬성듬성 모발’ 된다
-
8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9
‘연쇄살인’ 20대女에 당한 남자 또 나와…노래주점서 실신
-
10
‘李 공소취소’ 당 공식기구 만든 정청래…공취모 “우리와 별개”
-
1
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
2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6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7
브런슨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
8
‘짠순이 전원주’ 며느리도 폭로…“카페서 셋이 한잔만 시켜”
-
9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0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이건혁]새벽배송 규제 해소 첫발… 갈등 넘어 적기 개정해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4/13341640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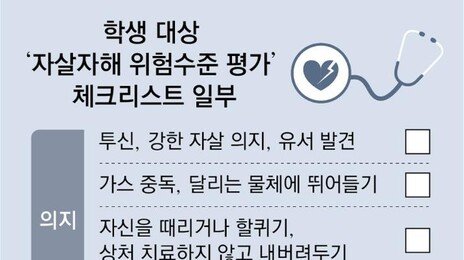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