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철주의 ‘삶과 죽음 이야기’]<4>생명연장을 거절하겠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8월의 무더위에도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다. 두 차례의 태풍경보에도 전화는 더 요란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8월 하순 나는 서울 신문로에 있는 각당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전화 응대에 귀를 기울였다. 아름다운 이별을 도와주는 곳이냐고 묻는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서류를 마련해 달라고 애원도 한다. 심폐소생술도 싫고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달지 않고 조용히 하직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며 캐묻는다. 이틀째 되는 날도 이런 전화는 이어졌다. 봉사자들이 제때 식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전화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악천후의 날씨일수록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일까.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절절한 내용은 창밖에서 쏟아지는 폭우만큼 세찬 인생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 부부가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야기, 그러나 이제는 깨끗한 인생 마무리를 위해 준비해야겠다, 무엇보다 내가 죽을 때 고통받고 싶지 않다, 자식들에게도 부담되기 싫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맹세를 했다, 저런 식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절대 안 한다는 소박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참 명쾌하기도 하다. 그 끝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봉사자 모두가 지칠 때쯤 나는 일어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가끔 환청으로 나타났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언제부턴가 변해 버린 것 같다. ‘나는 맑은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나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사전의료의향서(事前醫療意向書)를 작성합니다’를 선언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거기가 안락사 업무 보는 데냐고 물어요. 큰일 났다 싶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요. 절대 그런 데가 아니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분들을 도와 드리는 거라고요.”
시골에서는 ‘사전의료보관확인증’을 지갑에서 꺼내 자랑하고 다니는 노인도 꽤 있었다. 그것이 어느 날 ‘생명의 운전면허증’으로 표현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대충 맞는 것 같다. 인간이 더는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상태에서는 내가 고통스러운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치료 운전을 잘해 주십사 하고 의료진에게 부탁하는 소박한 당부가 그 카드에 담겨 있는 것 같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홍양희 회장은 이곳으로 걸려 온 전화의 특징을 요약해 주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용인시 수지, 고양시 일산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류 작성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주민들이 뒤를 이었다. 부산 창원 울산 지역도 많았다. 생활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지역, 은퇴자 인구가 많은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잠자기 전에는 곱게 접혀 있었던 손수건이 아침에 눈여겨보면 구겨져 있었다. 한참을 지나서야 알았는데 그 수건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는 데 쓰였다. 그러나 아내 눈 가장자리의 눈물자국은 여전했다. 어느 날 수건이 놓여 있던 자리에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현재의 의학에서 볼 때 제가 불치의 상태에 있고, 죽음이 다가왔다는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일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몇 개 문장 뒤에 아내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아내는 그날 오전 내내 깊은 잠에 빠졌다.
최철주 칼럼니스트 choicj114@yahoo.co.kr
최철주의 ‘삶과 죽음 이야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머니 컨설팅
구독
-

한규섭 칼럼
구독
트렌드뉴스
-
1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6
李 “그걸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떡합니까”…조현 외교장관 질책 왜?
-
7
[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
8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9
국힘 “장동혁 병원 이송 본인이 거부…모든 수치 정상 이하”
-
10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6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7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마크롱이 거슬리는 트럼프 “佛 와인에 200% 관세 부과할 것”
-
10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트렌드뉴스
-
1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6
李 “그걸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떡합니까”…조현 외교장관 질책 왜?
-
7
[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
8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9
국힘 “장동혁 병원 이송 본인이 거부…모든 수치 정상 이하”
-
10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6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7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마크롱이 거슬리는 트럼프 “佛 와인에 200% 관세 부과할 것”
-
10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최철주의 ‘삶과 죽음 이야기’]아내가 세상을 떠난 방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9/18/4948448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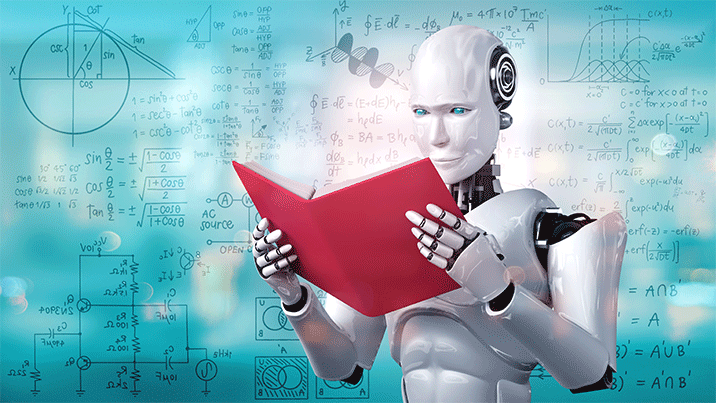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