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위크엔드 카페]안트베르펜 패션이 편안한 이유
-
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1분
글자크기 설정


최근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 인구 47만 명이 사는 이 작은 ‘패션 도시’에 들렀죠. 동 트기 전 서둘러 파리 북 역에서 국제 고속열차(탈리스)를 타니 2시간여 걸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패션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안트베르펜 패션을 만난다는 설렘! 애써 빠듯한 일정의 일부를 할애한 건, 이 패션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이 도시의 이름이 세계로 알려진 건 패션의 힘입니다. 안트베르펜 왕립예술학교는 드리스 반 노튼, 마르탱 마르지엘라 등 1세대 디자이너를 거쳐 베로니크 브랑키노, 스테판 슈나이더 등 2세대를 쏟아낸 최정상급 패션학교입니다. 도대체 안트베르펜은 어떤 힘을 지녔을까. 마치 사설탐정이라도 된 양 하염없이 걸으며 이 도시를 꼼꼼하게 관찰했습니다.
안트베르펜은 동화책 속 마을처럼 고요하고 깨끗했습니다. 번잡한 수도 브뤼셀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데 노트르담 성당 주변은 유럽 다른 나라들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각진 어깨 재킷을 입은 ‘엣지’ 있는 벨기에 남자들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또 걸었습니다.
아! 수많은 패션 피플이 올가을 한번쯤 탐내는 안트베르펜 디자이너 ‘드리스 반 노튼’의 여성복(사진)이 쇼윈도에 걸려 있었습니다. 톤 다운된 분홍색 재킷과 오렌지색 블라우스, 품이 넉넉한 황토색 배기팬츠… 어떻게 이런 색상 조합을 생각해냈을까,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색들은 왜 편안하고 고급스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을까. 호기를 부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재킷을 걸쳐보니 그 느낌이 참 편안합니다. 제게 부담스러운 가격만 빼고요.
나쇼날레 거리를 지나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비로소 안트베르펜의 속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골동품 가게들, 꼬마 숙녀들을 위한 질감 좋은 가죽구두 가게, 벽화가 그려진 골목과 카페들…. 그런데 정작 저를 감동시킨 건 현대미술관 주변 놀이터였어요. 그네며, 철봉이며 모든 놀이기구가 천연 나무로 돼 있는 놀이터. 편안한 차림으로 목재 놀이기구와 어우러진 한가로운 시민들의 모습에서 안트베르펜 패션의 근원을 깨닫게 된 거죠. 헌 옷에 감각을 불어넣어 낡은 옷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거나, 사람 몸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인간주의’ 패션 말예요.
한국에 돌아와 ‘드리스 반 노튼’을 국내에 들여오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계자에게 이런 감상을 얘기했더니, “어머, 저희 바이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라고 말합니다. 그 바이어의 말은 이랬답니다. “안트베르펜 디자이너들은 화려함과 섹시함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은 철학적이고 예술적 관점으로 옷에 접근하기 때문에 숙연함마저 느끼게 한다.”
日 교과서 왜곡 : 교과서 왜곡, 해법은… >
-

횡설수설
구독
-

한규섭 칼럼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6
李 “그걸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떡합니까”…조현 외교장관 질책 왜?
-
7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8
[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
9
“취한 듯 졸려?” 한파에 즉시 응급실 가야 하는 ‘이 증상’ [알쓸톡]
-
10
유흥주점 접대,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LH직원이 받은 뇌물들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6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7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10
마크롱이 거슬리는 트럼프 “佛 와인에 200% 관세 부과할 것”
트렌드뉴스
-
1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4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5
단순 잇몸 염증인 줄 알았는데…8주 지나도 안 낫는다면
-
6
李 “그걸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떡합니까”…조현 외교장관 질책 왜?
-
7
부부 합쳐 6차례 암 극복…“내 몸의 작은 신호 잘 살피세요”
-
8
[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
9
“취한 듯 졸려?” 한파에 즉시 응급실 가야 하는 ‘이 증상’ [알쓸톡]
-
10
유흥주점 접대,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LH직원이 받은 뇌물들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
6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7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
10
마크롱이 거슬리는 트럼프 “佛 와인에 200% 관세 부과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패션 단신] 프레타 포르테 부산 컬렉션 외](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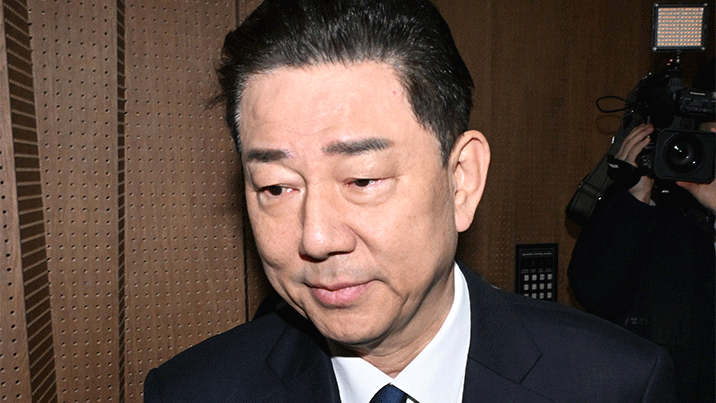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