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7대를 이어가는 옹기장이 가족
-
입력 2003년 5월 21일 15시 28분
글자크기 설정
경기 여주군 금사면 이포2리 '오부자 옹기'는 200년이 넘는 세월동안 7대를 이어가며 옹기를 만들어온 김일만(金一萬·62)씨와 아들 4형제의 일터.
한때 "지긋지긋하다"며 집을 뛰쳐나갔던 셋째 창호(昌鎬·34)씨는 "이제 흙의 정직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대로 전통 옹기를 만들며 살아온 가족의 삶과 애환을 담담한 어조로 풀어낸 창호씨의 '옹기의 길'이라는 글이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장려 수기 공모전에서 21일 최우수작으로 뽑혔다.
부친 김씨는 다른 길은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골수' 옹기장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그의 4대조 할아버지가 박해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 옹기를 굽기 시작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꽤 이름이 알려져 1996년 기능전승자로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됐다.
그의 네 아들도 가업(家業)을 이었다. 큰아들 성호(成鎬·40), 셋째 창호, 막내 용호(龍鎬·28)씨가 한 지붕 아래서 독을 빚고 둘째 정호(正鎬·37)씨는 인천으로 '스카우트'돼 나갔지만 가마 일을 할 때면 어김없이 돌아온다.
막노동보다 힘든 일이라 이들의 몸도 성한 데가 없다. 첫째와 둘째는 발로 물레를 하도 돌려 짝발이 됐고, 막내는 옹기를 져 나르느라 목뼈가 휘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옹기만 만들어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 부친 김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입대했다가 첫 휴가를 나와 보니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어 부대에서 남는 밥과 반찬을 얻어다 먹인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창호씨는 "플라스틱 용기에 바이오세라믹까지, 요즘엔 김치냉장고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몇 년 전부터는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둘째 정호씨는 아파트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생활옹기, 창호씨는 조경용 옹기를 주로 만든다. 그래도 첫째와 막내는 부친의 고집으로 전통 옹기에 매달린다.
창호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주대 도자기과에 입학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인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옹기 제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4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5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6
‘14명 사상’ 우도 차량 사고, 5초 전부터 액셀 밟았다
-
7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0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김정관, 러트닉과 관세 결론 못 내…“향후 화상으로 대화”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4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5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6
‘14명 사상’ 우도 차량 사고, 5초 전부터 액셀 밟았다
-
7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0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김정관, 러트닉과 관세 결론 못 내…“향후 화상으로 대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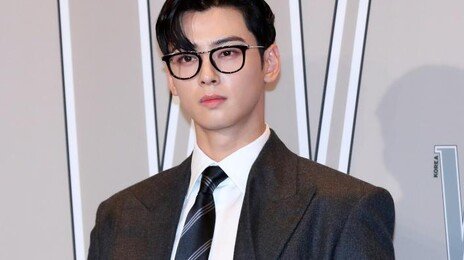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