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달이 지난 올해 7월, 작가는 갑작스레 눈을 감았다. 프랑스 대표 현대미술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1944~2021)의 첫 유고전을 담당한 양은진 큐레이터는 “그때는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겼는데 볼탕스키는 어렴풋이 죽음을 인지했던 것 같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세계 첫 유고전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시하려던 작품 또한 총 44점이었다. 날개 달린 천사 조각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설치 작품 ‘천사’(1984년)는 작가가 직접 들고 올 예정이었다. 작가의 사망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43점이 진열됐다. 작가는 별세 직전까지 1년간 작품 선정, 공간 디자인까지 모두 맡았다. 양 큐레이터는 “1점은 작가님 영혼이 채워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삶과 죽음을 다루지만 인간 볼탕스키는 “미술가는 삶을 유희하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왔던 것처럼 재치있었다. 양은진 큐레이터는 “볼탕스키는 어떤 전시건 전시 이틀 전에 전면 취소하자며 큐레이터들을 당황시켰다고 한다. 이유는 ‘이 지역에 유명한 스시집이 있던데 그걸 못 먹어서’ 따위다”라고 했다. 이 때문인지 그와 10년 넘게 일해 온 프로덕션 팀원 2명은 이번 전시로 내한한 내내 울었다고 한다. 볼탕스키가 전시장 어디쯤에 앉아있고, 어떤 대사를 할지 가장 잘 알았던 사이였기에 그의 부재가 컸던 것이다. 볼탕스키는 예술가로서의 모습만 기억할 수 있도록 팀원에게 죽음에 가까워졌을 즈음 자신의 공간에 출입을 금했다고 한다.

부산=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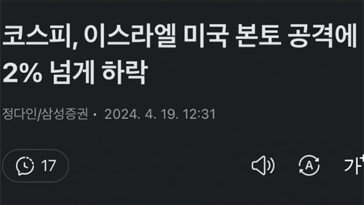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30분만에 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