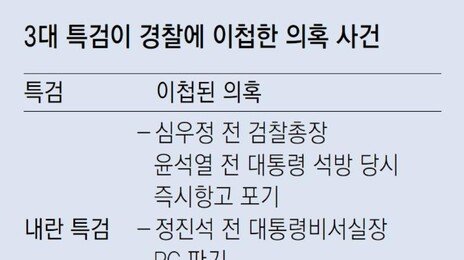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정성희]커리큘럼 패러독스
-
입력 2008년 10월 7일 20시 03분
글자크기 설정

전공의 벽 높은 한국 대학
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월가의 신화’가 무너지는 상황을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다. 어제 믿었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19, 20세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확신을 갖고 설계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실업계 아닌 일반 고교에는 진로교육이 부실하다 못해 없다시피 하다. 많은 학생이 적성과 희망에 관계없이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다. 대학에 들어간 뒤 ‘이건 아니다’ 싶어 재수 삼수를 하는 학생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선택 보류’가 자유전공학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 전공은 4년, 아니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비슷한 것이다. 학과 또는 전공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공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학교수와 그 제자를 포함한 전공자들의 이해(利害)가 그물처럼 얽혀 대학들이 학과는 물론이고 전공 커리큘럼 하나 마음대로 손대기 어렵다. 건국대가 취업률이 낮은 히브리·중동학과 등 비인기 학과를 폐지하는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면 그 일면을 짐작할 수 있다.
독문학과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 수가 그 언어의 모국인 독일의 대학보다도 많다고 한다. 독문학과 졸업생의 상당수가 고교 교사로 진출한 까닭에 독일어를 제2외국어에서 제외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미국 대학에도 전공은 있지만 학생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학생들은 대학 2학년까지 전공 구분 없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수 있다. 3학년에야 전공을 정하지만 전공 필수과목도 15학점 안팎에 불과하고 적성에 안 맞으면 쉽게 바꿀 수도 있다. 학생에게 지적(知的) 방황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대학처럼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많이 주는 곳은 따로 있다. 바로 고등학교다. 일단 배워야 할 과목 수가 너무 많다. 선택과목도 많다.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볼 때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과 함께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대부분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해 7개 과목에 응시한다. 대다수 대학이 전형에 반영하는 탐구영역 과목은 2, 3개이지만 학생들은 어떤 시험을 망칠지 몰라 4개 모두 선택하며 부담에 짓눌리는 것이다.
시험과목 너무 많은 고등학생
시험제도와 커리큘럼이 이렇게 설계된 배경은 분명하다. 담당 과목이 수능시험에서 제외될 경우 과목이 부실화하거나 장기적으론 없어질 수 있다. 이를 막으려는 교사들, 나아가 그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의 교수들이 여러 명분을 내세워 자기네 전공을 커리큘럼에 밀어 넣는다. 오죽하면 지난해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교과과정 개편이 교사의 권력투쟁’이라고 말했을까.
미국 영국 등은 고교의 과목선택권을 없애고 공통 필수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고교시절 강제로 필수과목을 공부해 놓아야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과목은 화학, 생물, 물리 등 주로 과학이다. 대학들도 입시전형에서 문과, 이과 공통되게 선수과목(AP)으로 과학을 요구하고 있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면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라’라는 권고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수능 과목 대폭 축소를 공약했지만 2012년부터 ‘탐구영역 1개 축소’를 결정한 데 그쳤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이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고교생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권을 주고, 대학생에게선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한국 커리큘럼의 역설을 풀지 않는 한 불쌍한 학생들의 방황은 계속될 것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씨네@메일 >
-

지금, 여기
구독
-

맹성현의 AI시대 생존 가이드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