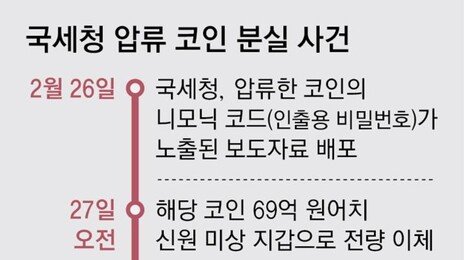공유하기
[오주석의 옛그림읽기]김명국 '답설심매도'
-
입력 2000년 8월 22일 18시 48분
글자크기 설정

멀리 눈 덮인 흰 봉우리가 흐릿한 윤곽을 드러낸다. 날카롭고 각지게 힘찬 마른 붓으로 그려서 삼엄한 겨울 딱딱하게 얼어붙은 자연이 실감난다. 밤새 함박눈이 내렸을까? 아니, 양지 바른 집 근처 나뭇가지에 눈이 녹은 것을 보면 겨우내 묵은 눈 같다. 그러니 봄이 이제 멀지 않았다. 다리 아래 얼음 무더기는 녹아서 흘렀다가 다시 얼어 이곳에 쌓인 것이 아닌가? 오른편 아래 구석에 폭포가 꽁꽁 얼어붙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도 심술궂어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지난 겨울이 남긴 상흔일 뿐이다. 머지 않아 가지 위에 따스한 볕이 쪼이면 매화 봉오리가 살포시 실눈을 뜰지 모른다.
하지만 선비는 조바심에 가만히 집에 앉아 기다릴 수 없다. 저 남쪽 어딘가 눈발 속에 첫 봉오리가 벌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집 앞 나무는 가지가 메말라서 뼈만 남았다. 단지 나무뿐 아니라 산도 물도 모두 얼어 자연의 뼈다귀를 드러내었다. 이것이 감상자의 심금을 맑고 투명하게 울린다. 예각으로 틀어지면서 험상궂게 옹이를 드러낸 나무들. 잔가지 획을 게 발처럼 뽑아 그렸기 때문에 해조묘(蟹爪描)라 부르는 이 필법은 혹심한 추위를 견디는 꼬장꼬장한 겨울 나무의 혼이다.
겨울 끝머리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퍼뜨리는 농주미인(弄珠美人) 매화. 간밤 꿈속에 선비는 ‘구슬을 희롱하는 미인’을 보았다.
눈 밟고 매화 찾아가는 그림 ‘답설심매도’는 첫눈에 눈과 추위로 격리된 닫힌 공간을 보여 준다. 하지만 오른편 구석 강렬한 흑백 대비의 바위를 중심으로 집, 나무, 나그네가 우선 펼쳐지고, 다시 위태롭게 솟아오른 절벽과 원산이 부챗살처럼 퍼져나간다. 보는 이는 이가 시리게 매서운 추위를 느낄지 모르나 차가운 설경 속 눈서리를 무릅쓰는 선비의 마음 속엔 흐뭇한 봄의 설레임이 있다. 옛부터 겨울 그림은 고상하고 심지 굳은 선비들이 좋아했다. 자연이 길을 막아 절로 속세와 멀어진 뜻이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겨울 그림은 무더운 여름에 감상하는 것이 제격이라 한다.
오주석(중앙대 겸임교수)josoh@unitel.co.kr
김정운교수의 여가클리닉 >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김승련 칼럼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6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7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8
“갤S26 화면보호 기술 5년 걸려… 복제 쉽지 않을 것”
-
9
트럼프 “이란 함정 9척 격침…해군 사령부도 거의 파괴”
-
10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5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6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7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6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7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8
“갤S26 화면보호 기술 5년 걸려… 복제 쉽지 않을 것”
-
9
트럼프 “이란 함정 9척 격침…해군 사령부도 거의 파괴”
-
10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4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5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6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7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정운교수의 여가클리닉]혼자있는 주말에 슬픈 비디오 한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5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