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이동관/'대한민국 대표선수' 의 말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19분
글자크기 설정

YS의 이 발언에는 북한정권에 대한 ‘괘씸함’이 적지 않게 깔려 있었다. 95년 여름 결행한 대북 쌀 원조가 수송선 ‘씨아팩스’에 대한 북한의 인공기 강제 게양 사건 등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는 바람에 ‘보태주고 뺨만 맞은’ 결과가 됐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발언의 후유증이었다. YS의 한 측근은 “이런 발언 이후 각종 정보기관에서 대통령의 심기에 영합하듯 ‘북한 붕괴’와 관련된 정보와 첩보만 쏟아져 들어왔다”고 실토했다. 우리 정치 지형에서 대통령의 말이 ‘액면’보다 ‘함의(含意)’로 해석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역대 대통령이 드러낸 또 하나의 닮은 점. 권력의 일반적 속성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들이 권력에 익숙해져 가면 갈수록 남의 말을 듣기보다 다변(多辯)이 돼 간다는 점이다.
수시로 역대 대통령들에게 조언을 해 온 한 원로 종교인은 “대부분이 임기 초에는 ‘기탄없이 직언의 말을 들려 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이다가 1년쯤 지나 만나 보면 예외 없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혼자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경우는 많은 부하가 희생된 아웅산 사태 직후 귀국해 만난 자리에서 열을 올려 동남아 순방 성과 등을 설명해 어안이 벙벙해진 적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최근 ‘잡초 제거론’을 담은 e메일 발송으로 다시 한번 ‘말’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어법은 ‘다변’과 ‘잦은 감성적 용어의 사용’ ‘직설적 화법’ 외에 ‘양의(兩意)적’이란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잡초론 e메일 파문에 대해 “원론적 얘기였다. 오해의 빌미가 됐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것처럼 그는 돌출발언 때마다 “본의가 잘못 전달됐다. 양해해 달라”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언론의 왜곡보도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남북대화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 “반미주의자면 어떠냐”는 발언 때도 마찬가지였다. 확대해석하면 마치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난리냐”는 식의 대응인 셈이다.
여기다 종종 신당 창당문제와 이라크 파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내 생각은 따로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법을 사용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노 대통령의 다변과 말의 안정감 부족에 대해서는 특유의 탈(脫) 권위적인 소탈한 성격이나 오랜 비주류 생활에서 비롯된 습벽이란 분석도 있지만 ‘바람’에 힘입어 손쉽게 권력의 정점에 오른 탓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도자의 말은 ‘절제되고 간명(簡明)해야’ 한다. 감성적 이미지의 메시지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설명력이 있어야 한다. 영(令)이 서도록 말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구구한 억측이나 관료기구의 ‘알아서 기는’ 행태, 나아가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로 나서는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의 말은 더더욱 계산되고 정제된 것이어야 한다. ‘담판을 짓겠다’는 식의 감정적 태도나 ‘튀는 말’ ‘모호한 논법’은 모두 금물이라는 게 과거 정상외교의 교훈이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 정치권 인사는 “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반적인 시각은 아직도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선수’ 노 대통령의 선전을 고대한다.
이동관 정치부차장 dklee@donga.com
광화문에서 >
-

현장속으로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2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7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10
김정관, 美러트닉과 ‘관세갈등’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협의”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10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트렌드뉴스
-
1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2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7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10
김정관, 美러트닉과 ‘관세갈등’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협의”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10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임보미]‘전설’도 시작은 미약하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9/13326241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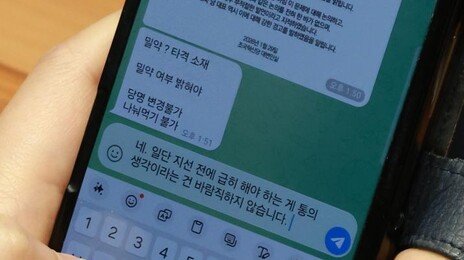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