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작은 집, 좋은 것들에 관하여[공간의 재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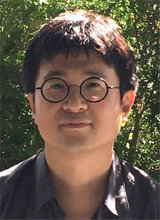
그때 3억5000만 원에 판 아파트는 고공 행진을 계속해 지금은 11억 원이 넘는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래, 그만하자. 그렇게 한옥-빌라-한옥을 전전하다가 약 1년 전 이 집을 지었다. 사계절을 보냈고, 올해 두 번째 봄을 맞는다.
이 집에서 행복하다. 우선 안도감이 크다. 이 집이라도 짓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는가. 아파트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 전세만 고집했더라면 치솟는 전셋값에 골머리를 앓을 뻔했다. 집 짓는 데 총 6억 원이 들었으니 생각보다 큰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집 짓고 나면 10년은 늙는다는 풍문이 흉흉했지만 지금 내 마음과 피부는 어느 때보다 좋다.
무엇보다 ‘단독의 시간’이라 좋다. 층간소음으로 예민해질 필요도 없고 주차장의 멋진 차들을 보며 부러워할 일도 없다. 이렇게 저렇게 엮이는 일 없이 그저 나로 살면 된다.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든 작은 나무 한두 그루 정도는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마당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볕을 쬐며 가만 멍을 때리고 있으면 저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충전이 되는 기분이다.
그리고 ‘단독의 풍경’.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한옥의 기와, 저 멀리 오래된 회화나무, 그리고 나만 아는 하늘이 알게 모르게 마음의 사막화를 막아준다고 믿는다. 집을 유지하는 번거로움보다 누리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 좋은 이야기만 썼지만 세상 이치가 어디 그런가. 해소되지 않는 아쉬움도 있고 ‘아, 어떻게 해야 하나’ 당최 답이 나오지 않는 난관도 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까지 아프게 할 그늘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정성갑 한 점 갤러리 클립 대표
트렌드뉴스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7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8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9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8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트렌드뉴스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7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8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9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8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