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최창봉]‘국민보다 조직’ 검찰 수뇌부의 자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6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스스로 뼈저린 반성을 하지 않으면 다음 검찰개혁 논의에선 남은 수사지휘권도 모두 빼앗길지 모릅니다.” 5일 수도권 지검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확산되는 위기감을 이렇게 전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맹비난을 받으면서 검찰의 고립감과 좌절감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수정 의결된 데 이어 궁지에 몰린 김 총장의 사퇴마저 싸늘한 시선을 받자 검찰은 충격 속에 말문을 닫았다.
두 달 남짓 이어진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은 “경찰 권력이 통제를 받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제도 역사와 법체계를 따져볼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 경찰이 지배하는 ‘경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일부 검사는 “왜 우리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몰라주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은 이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파문이 일어났을 때 검찰 수뇌부는 책임 소재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특임검사를 임명했지만 “누군가 사표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아예 없었다. 당시 대부분의 검사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의혹이자 일부 검사만의 문제”라고 치부했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도 자성(自省)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논의에서 검찰이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수사개시권이 아니라 국민 신뢰다. 조만간 결정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도 이 부분이다. ‘조직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아집을 깨뜨려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한 검찰이 제 자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을 지켜줄 존재는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최창봉 사회부 ceric@donga.com
기자의 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구독
-

주성하의 ‘北토크’
구독
-

김승련 칼럼
구독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북한, 러시아에 3만 3000여개 컨테이너 보냈다…탄알 등 군수 물자 추정
-
5
항암제 안 닿는 ‘암의 심장부’…박테리아가 침투해 무너뜨린다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8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9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10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7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8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북한, 러시아에 3만 3000여개 컨테이너 보냈다…탄알 등 군수 물자 추정
-
5
항암제 안 닿는 ‘암의 심장부’…박테리아가 침투해 무너뜨린다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8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9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10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7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8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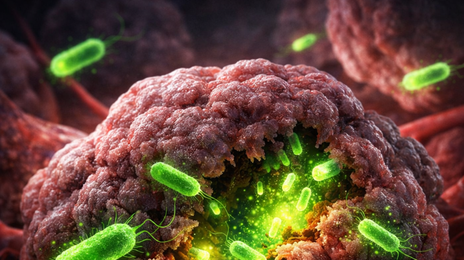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