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같은 시절
공선옥 지음 260쪽·1만1000원·창비

영희는 어떤 인물인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좋아했던 것도 잠시, 운영하던 가게가 철거되며 권리금, 시설투자금을 날리고 집주인에게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는다. 집 얻을 돈도 없어 도시 근교 진평리의 빈집을 찾아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끌려 엉겁결에 시위에 동참하게 된다.

소설은 2011년 우리 현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확대해 공감을 끌어낸다. 시위라고는 평생 남의 일로 여겼지만 대책위원장이 되고 법정 소송까지 하게 되는 영희, 일감을 찾아 4대강 공사현장을 기웃거리는 영희의 남편 철수, 한국 노모를 모시는 베트남 며느리, 편파적인 기사를 싣는 지역신문, 얼굴만 삐죽 내밀며 사태 해결에는 무관심한 정치인 등. 단지 꾸며진 얘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얘기’다.
무겁고, 딱딱하지 않게 비극을 희극처럼 풀어가는 솜씨도 탁월하다. 베트남 며느리가 시장에서 만난 영희에게 바나나를 건네주자 주위에서 “시위도 안 나올 건디 뭣이 이쁘다고 주냐”라고 한마디 한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할머니들은 천진난만하게 경찰에게 농을 건네고 이 상황이 재미있어 서로 자지러지게 웃는다.
진평리에서 먼저 세상을 뜬 망자의 얘기로 시작해, 시위에 참가했던 할머니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이들은 살갑게 지내던 가족과 동네 사람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맴돈다. 산 사람이 못 지킨다면 죽은 사람이 나서서라도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문학예술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구독
-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초등 1·2학년 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추진…교사노조 반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셀프건강진단]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4673135.1.thumb.jp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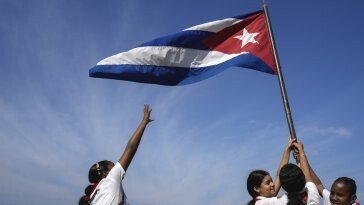
韓-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외교공한 교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책의 향기]과학자가 처방한 음악이라는 묘약](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8/02/10/88603443.1.jpg)
![[책의 향기]뱃살 두둑해야 특급 검투사… 여성끼리 싸움도](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3/10/05/58016812.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