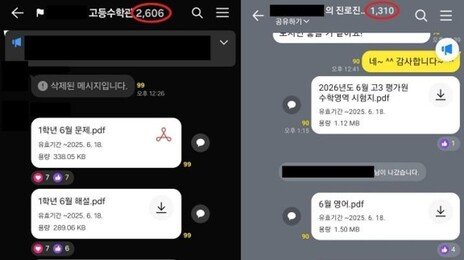공유하기
[의료분쟁 25시]‘제로섬 게임’ 의료분쟁, 완충지대 필요하다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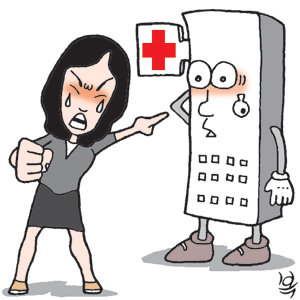
환자도 의사도 모두가 패자
그런데 기사가 나간 후 연락이 끊어졌다. ‘혹시 못 봤나’ 싶어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남겼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냥 그렇게 연락이 끊겼다. 이유는 대략 짐작이 갔다. 제보자는 기사를 통해 병원과 의료진이 ‘처벌’받기를 원했던 것 같다. 이름과 그간의 행적이 낱낱이 적힌 그런 기사를 원했을 것이다. 기사에는 제보자의 심정 정도만 반영됐으니 실망했을 법하다.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자에게 연락해 왔다. 그들은 의료진과 병원의 이름을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추방당하길 바랐을 수도 있다. 그들의 심정을 100% 대변하는 기사를 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 하지만 그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취재를 하면서 의사도 원인을 모르거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컨대 관상동맥은 60, 70%가량 막혀 있어도 수술 전에는 체크되지 않다가 마취 후에야 문제를 일으킨다. 의료 사고에도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그 범위가 오히려 더 넓을 수 있다.
소송당했던 의사도 판결과 관계없이 크게 타격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동네에서 작은 정형외과를 하는 한 의사는 “처음엔 어린애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 뇌출혈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점점 악화되더니 뇌출혈로 사망했다. 애초 부모가 ‘추락’이라고 말했으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했을 것”이라며 “아직도 소송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소송 없이 해결할 순 없을까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굳어져 갔다. 처음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을 때도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거나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소송은 마지막 선택이니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지금의 의료분쟁은 환자가 나가떨어지든지 의사가 죄다 뒤집어쓰든지 해야 끝이 난다”고 말했다. 완충 지역이 없다는 얘기다.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든 덮으려고만 하는 의료진, 뭔가 속고 있다는 찜찜한 기분에 시달리는 환자, 양쪽 모두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은 아직 ‘의료분쟁 후진국’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각계 표정-주한미군 >
-

오늘의 운세
구독
-

행복 나눔
구독
-

한시를 영화로 읊다
구독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5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6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7
與 합당 제안에…조국 “국민 뜻대로” 당내 논의 착수
-
8
[속보]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10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6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7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8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9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10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5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6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7
與 합당 제안에…조국 “국민 뜻대로” 당내 논의 착수
-
8
[속보]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10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6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7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8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9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10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