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인지 해인지 아리송한 그 순간, 자연과 내가 하나됨을 보았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0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6년만에 개인전 여는 김병종 교수
내달 30일까지 U.H.M.서 48점 전시… 자연에 압도됐던 유년 경험 등 그려
“붓 한자루로 호랑이와 싸운다 생각, 새벽 5시부터 작업… 열정 끓어올라”

생명을 주제로 작업해 온 김병종 서울대 명예교수 겸 가천대 석좌교수(69)가 서울 용산구 갤러리 U.H.M.에서 6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21점을 포함해 총 48점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일인 9일 갤러리에서 만난 김 교수는 “최근 200호, 300호가 넘는 대작들과 씨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화홍산수’, ‘풍죽’, ‘송화분분’ 등 100호가 넘는 큰 작품을 다수 선보인다. 새로 제작한 작품은 2022년작 10점, 2023년작 11점이다.
김 교수는 “주로 새벽에 작업실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붓 한 자루를 들고 캔버스 앞에 섰을 때 교차하는 다양한 감정이 있다. 이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주로 밤에 작업했지만, 요즘은 오전 5시쯤 작업실로 이동해 오전 11시까지, 어떨 때는 저녁까지도 작업을 이어간다고 했다.

그는 그림 작업뿐 아니라 저서 집필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럽 여행기를 시와 그림으로 풀어낸 ‘시화기행’ 두 권을 펴냈다. 조만간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 생명을 주제로 한 대담을 엮어 ‘생명 칸타타’(가제)를 출간할 예정이다. 최 교수는 과학자의 관점에서, 김 교수는 예술가의 관점에서 생명에 관해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김 교수는 지난해 작고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도 각별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다. 2014년 ‘김병종과 이어령의 생명 동행’ 전시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김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붓으로 쓰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쯤 “내가 퍼뜨린 문자의 밈(meme)으로 내 후손이 남겨진다고 생각한다”며 “김 교수는 색채와 형상의 밈을 많이 퍼뜨려 후손으로 번성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요즘 작업을 하면서 작품을 향해 “내 정신을 잘 담아달라”거나 “죽어있는 물질이 아닌 생동하는 밈으로 가득 차 반응해 달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아직 제 양쪽 눈의 시력이 모두 1.5이고, 정신과 몸 상태도 최고조에 오른 것 같습니다. 다시 200호, 300호짜리 화판을 다량 맞췄어요. 대작을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무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5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6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20만전자’-‘백만닉스’…반도체 훈풍타고 나란히 최고가
-
9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7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8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트렌드뉴스
-
1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5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6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7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8
‘20만전자’-‘백만닉스’…반도체 훈풍타고 나란히 최고가
-
9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4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7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8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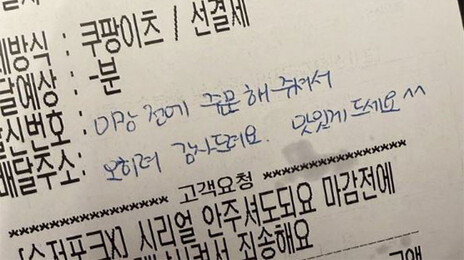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