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결혼에 관하여 20선]<12>알링턴파크 여자들의 어느 완벽한 …
-
입력 2009년 5월 14일 02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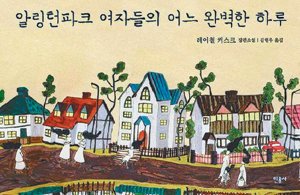
《“존경하는 마운트포드 선생님, 그동안 왜 제 소식이 들리지 않는지 궁금하셨죠? 왜냐하면 저는 죽었거든요. 제 남편 베네딕트가 저를 죽였어요. 아주 친절하게 죽여 줬기 때문에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저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엄마로만 사는 불안과 권태
여주인공 5명 중 한 사람인 줄리엣이 ‘넌 분명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칭찬하던 고교 시절 영어 교사에게 쓴 편지의 일부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줄리엣의 긴 생머리를 더듬는다.
이 소설은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가상의 베드타운 알링턴파크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을 다뤘다. 주인공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쇼핑을 즐긴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비웃거나 비교하고, 다른 남성과의 은밀한 관계도 꿈꾼다.
제목의 ‘완벽한 하루’는 역설적이다. 넷째 아이를 임신한 솔리. 그녀는 평소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됐지만 남는 방에 외국인 여성을 들이면서 자신이 쌓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비슷한 나이지만 훨씬 젊어 보이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면서 세 아이와 남편이라는 핏줄에만 의지한 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
미모의 스테파니에게 남편은 구세주였다. 하층민 출신인 그녀는 남편을 만나 궁핍한 연립주택을 벗어나 알링턴파크로 들어왔다. 자칫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삶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스테파니는 어느 순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결혼 전 직장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로 ‘투사’로 불리던 어맨다는 아이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신의 삶이 사라졌음을 발견한다. 런던에 살다 남편의 이직으로 알링턴파크로 이사 온 메이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라고 소리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실제 아내이자 엄마인 자신의 삶을 토대로 여성의 고민을 생생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30대 후반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사라져가는 젊음에 대한 위기의식, 자신의 일과 이름을 상실한 채 아내와 엄마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불안과 권태다.
‘알링턴…’은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소설 속 주인공들은 명품을 좋아하고 때로 일탈조차 주저하지 않는 드라마 속의 ‘용감한’ 주인공들과 비교하면 소심하고 현실적이다.
남편이 자신을 소리 없이 죽이고 있다고 여기는 줄리엣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줄리엣은 남편이 좋아하는 긴 생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것으로 복수한다.
“그냥 정리만 해 드릴까요?”
“아뇨, 잘라주세요.”
“전부 다요?”
미용실 직원은 ‘건너편에 커피숍이 있는데 30분쯤 생각하시면 어떻겠냐’며 친절함을 보인다. 하지만 줄리엣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냥 잘라만 주세요”라고 한다.
알링턴파크 여성들의 단호함은 여기까지다. 이들은 한 잔 와인의 취기에 넋두리와, 속으로 상대방들을 비난하면서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작품 속 남성들의 모습은 대부분 망가진 외모에 무미건조하고, 매력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남성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라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성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완벽한 하루.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로의 반쪽을 포기한 삶은 그 자체에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트렌드뉴스
-
1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2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3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7
연봉 100배 스카우트 거절…EBS 1타 강사, 교실에 남은 이유
-
8
떡볶이 먹다 기겁, 맛집 명패에 대형 바퀴벌레가…
-
9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10
“시력 잃어도 볼수 있다”…머스크 “증강기술 승인 대기”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3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4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5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6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7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8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트렌드뉴스
-
1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2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
3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7
연봉 100배 스카우트 거절…EBS 1타 강사, 교실에 남은 이유
-
8
떡볶이 먹다 기겁, 맛집 명패에 대형 바퀴벌레가…
-
9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10
“시력 잃어도 볼수 있다”…머스크 “증강기술 승인 대기”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3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4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5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6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7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8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