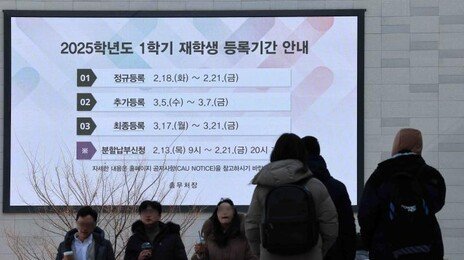공유하기
[그림으로 읽는 세상]모딜리아니와 잔, 영혼의 짝
-
입력 2008년 2월 12일 02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불꽃 사랑은 운명을 뚫고 불멸로…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도 술과 여자에 빠져 있던 ‘모디’였으나 잔은 특별했다. 뜨거운 연모의 대상이자 희생적인 아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준 동반자 겸 뮤즈였던 것이다. 자기 세계가 있는 여성들을 사랑해 온 이 천재 화가는 마지막 연인의 작가적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예술적 스승이었을 것이다.
3월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아람미술관(031-960-0180)에서 열리는 ‘열정, 천재를 그리다’전은 아마데오 모딜리아니(1884∼1920)와 아내 잔 에뷔테른(1898∼1920)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찾아본 전시의 테마는 ‘모디’라는 애칭으로 불린 모딜리아니 부부의 작품과 자료를 통해 다시 조명해 보는 ‘사랑’이다. ‘운명적 만남’ ‘짧았던 행복, 니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등 사랑의 연대기로 구성된 전시는 우리 시대의 참을 수 없는 사랑의 가벼움을 돌아보게 한다.
미술사에서 전설적 동반자로 알려진 모디와 잔은 나이 차를 뛰어넘는 불꽃같은 사랑에 빠졌다. 둘의 ‘따뜻한 동행’은 3년 만에 막을 내린다. 결핵성 늑막염에 걸린 남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틀 뒤 여자는 부모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한다. 첫딸을 낳고 둘째아이를 가진 만삭의 몸이었다. 1920년 1월 26일의 일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영혼에게 휴식이란 없다/그는 늘 고통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외출을 한다’(유하의 ‘슬픔이여, 좋은 아침’). 사랑의 설렘과 기쁨도 한순간, 가슴 속 푸른 멍은 오래 남는다. 그렇다고 사랑의 부재를 견딜 수 없어 인생의 막을 스스로 내려 버린다? 허구에서 묘사되는 사랑보다 더 비극적인 사랑이 여기 실재한다. 전시된 작품의 갈피마다, 특히 죽음의 길마저 동반한 잔의 그림엔 사랑의 상흔(傷痕)이 배어 있는 듯했다.
관람객의 발길이 유독 오래 머무는 모딜리아니의 유화 ‘어깨를 드러낸 잔’(66×47cm·1919년). 죽기 1년 전에 완성된 그림에는 사랑하는 남자의 눈에 비친 사랑하는 여자의 신비한 매력이 일렁인다. 흰 얼굴에 풍성한 갈색 머리로 별명이 ‘코코넛’이었던 잔.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겠다”고 했다는 잔은 긴 목에 고개를 갸우뚱한 채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표정이다. 남편 앞에서 어린 아내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일까.
부부의 공동 드로잉(21.9×16.8cm)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의자에 앉은 모디와 잔. 간략한 선으로 인물의 특징을 포착해 내는 모디의 재능, 포도 송이를 섬세하게 그려 넣은 잔의 솜씨는 한 작가의 작품인 양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의 대사가 떠오른다. “어떻게 해야 널 끊을 수 있을지 알면 좋겠어(I wish I knew how to quit you)!” 동성애 코드의 울타리를 넘어 금지된 사랑의 덫에 걸린 연인의 ‘전쟁 같은 사랑’으로 의미를 확장한 이안 감독의 재능이 빛나 보이는 건, 금기든 아니든 사랑에 눈먼 이들은 절대로 연인을 잊거나 떠나는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 때문에 뼈아프게 살더라도/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고통 때문에 속 아프게 살더라도/이별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칩니다/사람과 헤어지면 우린 늘 허기지고/사람과 만나면 우린 또 허기집니다’(천양희의 ‘사람의 일’).
완벽한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인해 불행해져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처럼 잔은 그런 사랑을 했던 걸까.
고미석 기자 mskoh119@donga.com
바른식사 >
-

유상건의 라커룸 안과 밖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바른식사 좋은음식]점심식사는 직장과 먼곳에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