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연탄길' 작가 이철환씨가 들려주는 이외수 이야기
-
입력 2006년 9월 12일 16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그 소사 아저씨는 소설가 이외수 씨다.
300만부 넘게 팔린 '연탄길'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 이철환(44) 씨의 신간 '보물찾기'에는 이외수 씨의 유년시절과 학교 소사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이철환 씨는 '이외수 마니아'를 자처하며 그를 "문학적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다. 오는 24일 환갑을 맞는 스승에게 신간을 헌정하러 간 제자의 여행에 동행했다.
이외수 씨가 사는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 안내판에는 좌회전 표지 대신 왼쪽을 바라보는 새 그림과 함께 '새가 바라보는 쪽으로'라고 적혀 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맞절을 했다. 책에 감사의 말을 적어 스승에게 드리면서도 제자는 무릎 꿇은 자세를 쉽게 풀지 못했다.
"재작년에 이철환 작가가 날 찾아와 깜짝 놀랐어. 나는 한 문장 갖고 매대기를 쳐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작가는 문체도 내용도 이미 투명해진 사람이야. 그래서 날 찾아올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와서는 책 추천사를 써달라는 부탁도 어찌나 어렵게 하던지…."(이외수)
'행복한 고물상' 추천사에서 이외수 씨는 "이철환의 낱말들은 모두 눈물에 젖어서 파종된 낱말들"이라고 썼다.
두 사람은 가난한 유년 시절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이외수 씨는 "지금도 동냥밥 얻어먹던 생각이 나서" 고향 근처에는 가기도 싫다고 한다. 이철환 씨에게는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와 가난한 이웃의 삶이 모두 글감이다.
"작가들이 지적 허영의 외투를 입고 머리로 글을 쓰기 십상인데 그런 글은 불편해. 메시지를 독자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남겨야 진짜 작가지. 그런 점에서 이철환 작가의 글은 가슴을 적셔주는 근본치료제야. 사람이 어디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골라 먹을 수 있나. 이 작가는 그런 가난 불행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아름답게 승화시키지. 어떤 것도 꾸미지 않는 것, 이건 경지야."(이외수)
이철환 씨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선생님과 둘만 있을 때는 엄두도 못냈지만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이외수 씨의 데뷔작 '꿈꾸는 식물'부터 스승의 글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다.
"시집 '풀꽃 술잔 나비'에서 동화적 발상을 배웠고 소설 '들개'에서 예술가의 치열성을 엿봤습니다. 소설 '날다 타조'에서 깃털 빠진 새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듯했고…."
이철환 씨가 "이외수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사랑"이라며 기나긴 헌사를 마치자 이외수 씨가 "나도 못외운 걸 다 외우네"하면서 쑥스럽게 웃는다. "젊은 작가가 이렇게 산 채로 사랑해주니, 내가 제일 행복한 작가야."
이외수 씨는 문득 "햇살이 좋아 생각이 났다"면서 직접 작곡한 피아노곡 '가을햇살'을 들려줬다. 글과 그림 음악을 넘나드는 데 대해 그는 "칼국수 끓이는 사람이 수제비는 못끓이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여요. 음악과 미술과 문학이 다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야."
이외수 씨는 자신과 이철환 씨, 그리고 함께 자주 어울리는 소설가 박민규 씨를 "깡다구 3인방"이라고 소개했다. 글이 잘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쓰는" 스승을 좇아 제자들도 "용장 밑에 약졸 없다"며 글 한 줄 건져내기 위해 곡기를 끊어가면서 끝까지 매달린다고 한다.
"가슴에 남기는 게 없어서 문학을 죽인 사람들이 문학의 위기입네 떠드는데 이렇게 좋은 젊은 작가들이 있어서 문학은 죽지 않아요. 제대로만 하면 독자는 찾아옵니다.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본다고, 책을 안 읽으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이외수)
김희경기자 susanna@donga.com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북한, 러시아에 3만 3000여개 컨테이너 보냈다…탄알 등 군수 물자 추정
-
7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8
항암제 안 닿는 ‘암의 심장부’…박테리아가 침투해 무너뜨린다
-
9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10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3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3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4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북한, 러시아에 3만 3000여개 컨테이너 보냈다…탄알 등 군수 물자 추정
-
7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8
항암제 안 닿는 ‘암의 심장부’…박테리아가 침투해 무너뜨린다
-
9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10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3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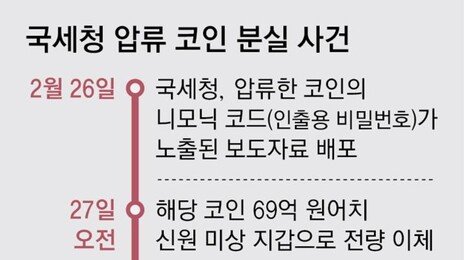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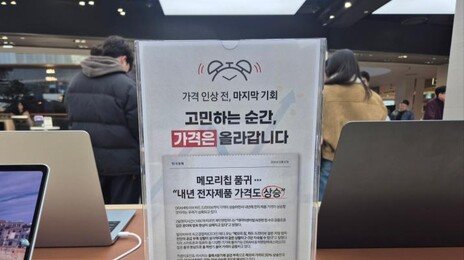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