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정부 초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에 육박했고, 재정확장 추세가 계속될 경우 현 정부 말인 2026년에 69.7%에 이를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급증한 빚을 줄이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모두 작년부터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선 걸 고려하면 한국의 대응은 늦은 편이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재정지출 확대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빠른 나랏빚 증가 속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재정이 더 악화하면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엄격히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뿐이고, 독일 등은 아예 헌법으로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말로는 예산 팽창, 나랏빚 증가를 걱정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경직성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혈세 낭비를 이유로 전 정부의 ‘세금 일자리’ 사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재정을 축내는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면서 새 정부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병사 월급 인상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포퓰리즘적 재정지출 경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내로남불식 진영논리를 벗어던져야 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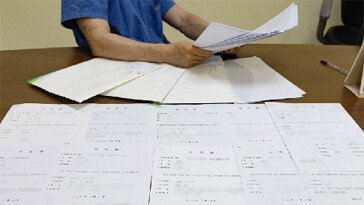
교수 집단이탈 없었지만… “진료예약 취소되나 종일 전전긍긍”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채상병’ 첫 피의자 조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부부 싸움나” 반대 의견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할 일은 않고 묘수만 찾아 헤맨 저출산 정책 18년](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25/124662118.1.jpg)
![[사설]산으로 가는 연금 개혁… 백지안 낸 정부 무책임부터 짚어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25/124643643.1.jpg)
![[사설]日 “네이버 ‘라인’ 지분 팔라”… ‘해킹 핑계’로 경영권 뺏으려 드나](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3/06/12384923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