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한시의 멋이 보인다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
입력 2002년 2월 15일 17시 1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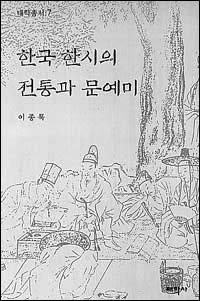
입만 열면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근년 들어 붙은 습관이다. 인문학은 시쳇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지 오래다. 둘러싼 환경이 온통 변했는데 인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만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막상 변한다고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없다. 여기에 인문학이란 것이 원래 그런 변화에 초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가세하면 사정은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나는 근래 들어 전과 다른 희망적인 징후와 만나는 기쁨을 심심찮게 누리고 있다. 대중성에 바탕을 둔 인문학의 가로지르기나 넘나들기의 모색은 그것대로 전문학자의 안목 덕에 새로운 힘이 실리고 있고, 순수 인문학 내부의 학문적 치열함이나 모색 면에서도 깊이와 너비를 갖춘 저작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는 까닭이다.
한문학 방면에서만 이야기하자면, 근래 강명관 교수의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푸른역사)는 전자의 측면에서, 이종묵 교수의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태학사)는 후자의 측면에서 내게 아주 뜻깊게 읽혔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한시인가? 이 교수의 이 책은 중국 아닌 우리 한시의 전통을 찾아내고,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시에서 시인의 의식을 논하는 대신 한시 자체의 문예미를 꼼꼼히 살핀다. 한시의 전통과 작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작품이 주는 감동을 음미할 수 있고, 이럴 때 한시가 현대인의 가슴에 와 닿는 고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간 한시 연구는 작가의식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감이 없지 않다. 정작 한시의 전통과 작법에 대한 연구는 도외시되었다. 중요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쓸모로만 보면 한시는 이미 쓰임을 잃은 문학이다. 지금도 운자를 내어 시재(詩才)를 겨루는 한시동호인 모임이 경향간에 없지 않고, 이따금 한시백일장이 각종 문화 행사의 하나로 열리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 사용처를 전혀 갖지 못한다. 오늘날 한시를 연구하는 것은 한시를 잘 짓자고 해서가 아니다. 옛 사람의 미의식과 세계를 읽는 안목을 한시를 통해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 오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손쉽게 읽히는 대중적인 한시 소개서가 아니다. 14편의 엄정한논문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전문 학술서이다. 모두 3부로 나누고 있는데, 1부는 한시의 전통과 작법을 다룬 7편의 논문을, 2부는 한시의 개성과 문예미를 논한 네 사람의 작품론을 한자리에 모았다. 3부는 시풍과 그 변화양상을 다룬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가 원론이라면, 2부는 적용이요, 3부는 종합인 셈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제 1부다. 사찰제영시(寺刹題詠詩·사찰 주변의 경관과 그곳에 오른 감회를 읊은 시)의 작법과 애정(愛情) 한시의 전통, 성리학적 사유의 형상화를 담은 도학시(道學詩)를 차례로 다루었다. 이어 ‘시는 그 사람’이라는 논리 아래 성행한 기상론과 궁달론(窮達論·시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이 드러난다는 주장)의 문제를 미감의 측면에서 다루고, 조선 중기 이달, 백광훈, 최경창 등 이른바 삼당시인(三唐詩人) 시의 언어적 짜임새를 면밀하게 분석한 글도 있다. 또 조선 전기 누정시(樓亭詩)를 허실(虛實)의 결합 관계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전대 시인의 표현을 바꿔 쓰는 용사(用事)와 옛 시문의 격식을 취해와 더 훌륭한 시로 만들어 내는 점화(點化)의 미학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저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우리나라 한시를 씨줄과 날줄로 얽어 짠 한 필의 아름다운 비단과 마주하는 느낌이 든다. 책 속에 우리나라 한시의 걸작들이 거의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것도 창작의 비밀과 각 구절의 연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말이다.
그의 말투는 곰살궂거나 섬세하지는 않다. 대신 꼼꼼하고 치밀하다. 한시가 주는 따뜻함과 웅숭깊은 여운을 음미하려는 독자들은 이점이 다소 불만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옛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창작에 임했고, 또 한 구절 구절 속에 어떤 행간이 숨어 있는지를 살피는 데는 길잡이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만 하다.
앞선 시인의 시구를 뒷사람이 끌어와 변용해 쓰는 용사(用事)의 미학을 다룬 글에서는 어떻게 낡은 옛 것이 낯선 새 것으로 변화되는 지를 다양한 용례를 통해 보여준다. 한시는 허(虛)와 실(實)의 안배로 시작되고 끝난다. 그 다양한 결합의 체계를 이해하면, 시인이 사물을 빌어 말하는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해박한 섭렵과 꼼꼼한 분석이 참으로 놀랍다.
책 속의 분석 방법은 현대시에다 적용하더라도 아주 유용하다. ‘한시의 언어와 그 짜임’ 같은 글에서 내부의 소리와 외부의 소리를 갈라내고, 술어를 생략하는 것이 빚어내는 효과를 따지는 것은 그 방법 그대로 현대시에다 적용하더라도 낯설 것이 없다.
2부의 작품론에서도 작법과 문예미, 형식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된다. 의고(擬古)를 하면서도 현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법을 논한 성현(成俔)론, 용사(用事)의 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룬 이인로(李仁老)론은 1부의 실제적 적용으로 읽힌다. 3부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시풍의 변화를 추적하여, 중국의 한시가 조선의 한시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폈다.
한시는 이미 가시덤불로 막힌 험한 길이다. 하지만 그 꽃밭에는 지금도 온갖 기화요초(琪花瑤草)들이 난만(爛漫)하게 피고 진다. 길을 뚫어 그때와 지금, 저기와 여기 사이에 숨통을 틔워주면 누구나 그 길을 자유롭게 산보하며, 향기에 취하고 자양을 얻어 힘을 북돋울 수 있게 된다. 옛날은 그때의 지금이고, 지금도 훗날엔 옛날이 된다. 다 변했다고 하지만 막상 변한 것도 없다. 변한 것은 껍질뿐이다. 형식뿐이다. 인문학이 더 소중한 까닭이다.
정민 한양대 교수·국문학
트렌드뉴스
-
1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2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
3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6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7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10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8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트렌드뉴스
-
1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2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
3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6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7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8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9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10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8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이철희 칼럼]김정은은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기다린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07506.1.thum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