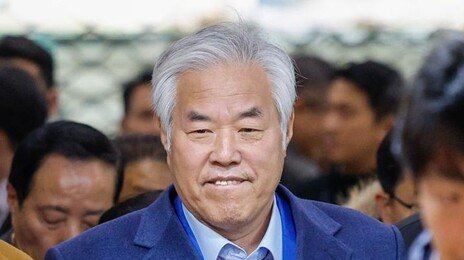공유하기
[사설]憲裁의「뒷북」치는 결정
-
입력 1999년 4월 30일 19시 45분
글자크기 설정
참으로 뒤늦은 이 결정 때문에 법에 따라 꼬박꼬박 상한 초과분에 대한 부담금을 낸 착한 보통사람들만 억울하게 됐다. 소원(訴願)을 내고 돈을 못 낸다고 버틴 사람들만 이 결정의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87년 개정 헌법에서 헌재를 법원 다음가는 장(章)으로 삼고 창설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전처럼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사권을 갖는 것보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하고 헌법 소원을 심판토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나 구제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 같은 것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동안 헌재가 나름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나 심판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도 들었다. 예를 들면 92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다툼에 대해 시간만 끌다가 관련법이 고쳐진 이후인 94년에야 비로소 “법률 개정으로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각하했다.
눈치보기의 산물이라든지 헌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대목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일부 위헌 결론도 비슷한 사례다. 89년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94년 변론종결이 되었는데도 정작 위헌 결론은 98년에야 내렸다. 땅투기 광풍이 사라지고 새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바뀌자 ‘뒷북’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법적 심판은 현실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다. 땅이 인간보다도 상위개념으로 치부되던 광란의 투기시대에 그 고삐가 되는 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법률 외적인 정치적 눈치보기나 경제정책적 상황논리에 급급해 예민한 사안을 마냥 미루거나 정치적으로 자동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대한 배신이며 권리구제라는 임무를 등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안 역시 법을 세우는 기관이어야 할 헌재가, 선선히 법을 좇으며 사는 선량한 다수의 납부자만 손해보게 하고 허탈감만 안겨준 ‘뒷북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6만여건의 부담금 1조6천6백억여원을 낸 국민의 쓰라린 가슴을 헤아려볼 일이다. 애초부터 사유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논란에 휩싸인 채 정부 주도로 입법된 법률이 정부에 의해 폐지된 이후까지 결정을 미루어온 점은 헌재가 변명할 여지조차 없을 것 같다.
화제의 비디오 >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트렌드뉴스
-
1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2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
3
이동국 세 딸 일본 미녀 변신…“행복했던 삿포로 여행”
-
4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5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6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
7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8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
9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10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9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10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트렌드뉴스
-
1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2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
3
이동국 세 딸 일본 미녀 변신…“행복했던 삿포로 여행”
-
4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5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6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
7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8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
9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10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9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10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