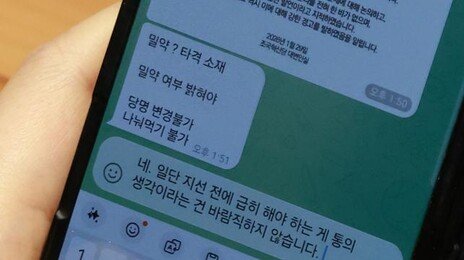공유하기
정규직-비정규직 중간지대 ‘무기계약직’ 은행원들에 들어보니
-
입력 2009년 7월 7일 10시 14분
글자크기 설정

“부모님이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젠 ‘내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에서 근무하는 노미선 계장(26·여)은 작년 9월 비정규직 꼬리표를 뗐다. 2004년 12월 입행한 뒤 1년마다 재계약하며 비서나 창구직원으로 일하다 3년 9개월 만에 사실상 고용을 보장하는 무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는 “요즘은 정규직이라는 생각으로 일한다”며 밝게 웃었다.
국회의 비정규직법 처리 지연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위험에 떨고 있지만 은행권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2007년 7월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나 전환 정규직으로 바꾼 덕이다. 무기계약직은 임금은 정규직에 못 미치지만 해고요건과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비슷하게 조정한 것이고, 전환 정규직은 임금 외에 정년과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고용형태다.
○ 생활 안정에 만족
대다수 시중은행은 비정규직의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 인력의 3분의 2 정도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도 근무 연차가 2년이 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고용 형태가 바뀐 은행원들은 무엇보다 생활이 안정됐다는 점에 만족한다. 국민은행에서 일반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하모 주임(29·여)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평가결과가 나빠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는데 이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7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재작년 11월에 ‘전환 정규직’으로 바뀐 우리은행의 정모 대리(37·여)도 비슷한 생각이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정규직’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오지만 정 대리는 “정규직이 됐다는 말을 듣고 깡충깡충 뛰며 좋아하던 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거나 휴가철 회사 콘도를 신청할 때면 ‘내가 우리은행 직원이구나’ 하는 소속감에 뿌듯해진다고 한다.
○ “내 회사라는 느낌에 일할 맛 나”
한 시중은행의 경기 고양시 영업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김모 씨(35)는 최근 2개월 동안 주택종합청약통장 가입자를 150명 가까이 모집했다. 고객뿐 아니라 부모, 친척, 전 직장 동료, 학교 동창 등에게 애걸하다시피 부탁한 결과물이다. 김 씨가 일반계약직이던 2000년대 초반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때는 이만큼 열성적이지 않았다. 김 씨는 “내 회사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모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김포공항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는 차태경 주임(25·여)은 작년 3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지난달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근속연수가 2년이 채 안 됐지만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아 조기 전환된 사례다. 차 주임은 “출산휴가나 자녀 학자금도 정규직과 똑같이 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그래도 정규직에 대한 미련은 남는 듯 “10월 정규직 전환 시험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을 완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만 바꿔도 당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으로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고용 조정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8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9
호주오픈 결승은 알카라스 대 조코비치…누가 이겨도 ‘대기록’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