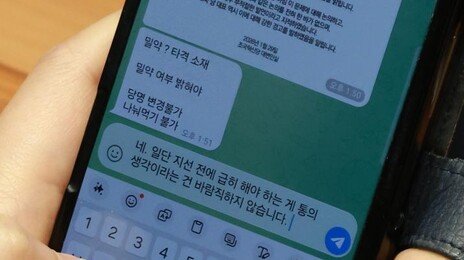공유하기
[理知논술/고전여행]털 없는 원숭이의 행복론
-
입력 2009년 4월 27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 ‘털없는 원숭이’
로마의 콜로세움이 처음 문을 열던 날, 무려 5000마리의 짐승이 죽어 나갔다. 단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였다. 정도만 덜할 뿐, 잔인한 장면을 원하기는 현대인도 마찬가지다. 애꿎은 소들의 숨통을 끊는 투우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구경꾼들은 피 튀기는 격투기 경기에 열광한다. 어디 그뿐인가. 살기(殺氣)로 번득이는 공포 영화는 숱한 관객들을 불러 모은다.
끔찍한 영화나 경기를 모두 금지시키면 어떨까? 사회는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을까? 하지만 유치원 같은 순수한 세상에서 살기 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험과 폭력에 좇으려 한다. 막장 드라마가 괜히 인기를 끌겠는가.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 인간은 ‘털 없는 원숭이’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인간도 결국 동물이라는 의미다. 우리 안에는 동물의 습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살펴보자. 사업가들은 ‘한몫 잡으려(make a killing)’ 하고, 과학자들은 암 치료법을 ‘추적하며(tracking down)’, 화가는 완벽한 그림을 캔버스에 ‘잡아 두려고(trap)’ 하고, 정치가는 경제발전을 ‘목표(aim)’로 한다.
곰곰이 따져보면 사냥에서 온 말들이 참 많다. 먹을거리를 잡으러 다니던 털 없는 원숭이들이 남긴 유산인 셈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냥에 대한 욕구가 살아있다. “숨 쉬는 횟수가 아니라 숨을 멎게 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던가. 계획, 투쟁, 위험감수, 성공은 삶을 짜릿하게 하는 순간들이다. 하나같이 먹잇감을 손에 넣기 위해 거치는 과정들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사냥은 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상징(symbol)’으로 실제 먹잇감을 바꾸는 재주가 있다. 상장은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상 받는 이들은 커다란 소를 잡은 때만큼이나 기뻐한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주는 뿌듯함은 두 손 가득히 사냥감을 움켜쥔 원시인의 그것과 별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인류가 폭력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인간은 참 온순한 동물이다. 고릴라는 셋만 모여도 죽일 듯이 싸운다. 하지만 인류는 수백만 명이 모여서도 별 탈 없이 잘 살아간다. 이 또한 사냥으로 길러진 ‘본성’이다. 사냥을 하는 데는 협력이 중요하다. 다급한 성질을 죽이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을 테다.
가족에 대한 유별난 사랑도 사냥으로 설명된다. 동물은 번식기 때만 짝짓기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랑에 빠진다. 모리스에 따르면, 이 때문에 인류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기어 다니는 동물도 많다. 반면, 인간은 사람구실을 하려면 십수 년을 키워야 한다. 남성이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다녔다면, 여성이 남성을 끈끈하게 붙들어 매지 못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사랑과 가족애는 사람들을 묶는 접착제 구실을 했다.
현대인들은 우울하다. 선진국일수록 자살자가 많고 사이코패스도 늘어난다. 모리스는 그 이유를 털 없는 원숭이의 본능을 무시한 탓에서 찾는다. 인류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싫어한다. 단조로운 일거리는 ‘풀을 씹어 먹는 소’에게나 어울린다. 뛰어다니며 사냥하던 인간은 자극과 모험, 성공과 성취를 원한다. 완벽하게 안전망이 갖추어질수록, 사람들이 되레 침울해지고 불행해하는 이유다. 삶에서 짜릿함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마약이나 술에 빠져들기도 한다.
안정이 곧 행복은 아니다. 공무원, 교사는 희망 직업 1순위를 달리고 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진정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마음속 털 없는 원숭이의 소망에 귀 기울일 일이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7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7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